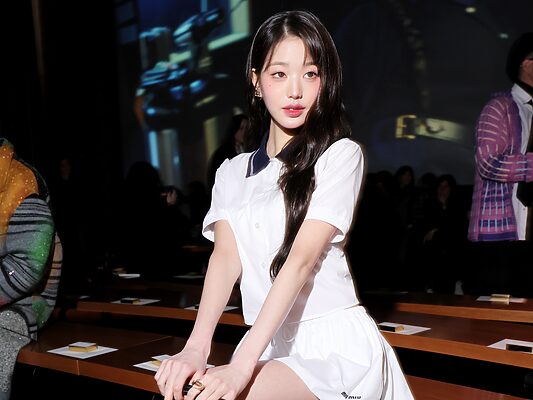나쓰메 소세키는 나를 좋게 만든다. 그 이름은 내게 곧 ‘멋’과 같은 말이라서, 구체적이며 사사롭기까지 하다. 심지어는 ‘여름 하’에 ‘눈 목’, 그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서 비밀스런 기쁨을 느낀(다고 누구한테 떠들 일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긴 하)다. <그 후>는 그의 소설 중 세 번째로 읽은 작품이지만 끝까지 다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나는 <그 후>의 도입부만 벌써 수십 차례 읽고 있다. 거기에
나쓰메 소세키는 나를 좋게 만든다. 그 이름은 내게 곧 ‘멋’과 같은 말이라서, 구체적이며 사사롭기까지 하다. 심지어는 ‘여름 하’에 ‘눈 목’, 그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서 비밀스런 기쁨을 느낀(다고 누구한테 떠들 일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긴 하)다. <그 후>는 그의 소설 중 세 번째로 읽은 작품이지만 끝까지 다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나는 <그 후>의 도입부만 벌써 수십 차례 읽고 있다. 거기에
어떤 이상이 깃들어 있는 걸까? 다이스케라는 청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외출을 나서기까지의 몇 시간을 틀림없이 간직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멋이라면 그런 멋을 부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젠가 초봄에 도쿄를 걸으며 다이스케를 따라 걷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 걸음이 내 것이라기엔 너무나 단정해서 놀라기도, 좀 비웃기도 했더랬다. <그 후>에서 다이스케가 넥타이를 매는 장면이 있었던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요지 야마모토의 이 도톰한 면 넥타이를 구입하면서 잠깐 나쓰메 소세키 생각을 하긴 했다. 계절은 한창 멋을 부리고 싶은 계절로 다시 돌아왔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장우철
- 포토그래퍼
- 이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