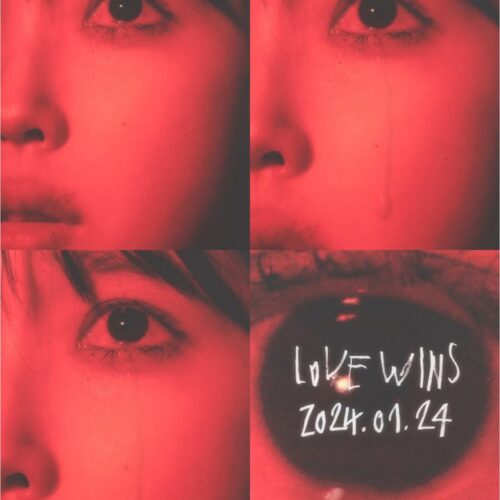누군가 살다 간 공간을 담아내는 로버트 폴리도리의 카메라는 과거에서 미래를, 그리고 영원을 본다.

베르사유부터 체르노빌까지, 가장 화려한 궁전부터 텅 빈 폐허까지 가로지른다. 사진을 찍을 장소를 고르는 기준은 뭔가? 역사가 있는 곳이다. 사건들이 벌어졌던, 시간이 축적된 장소들. 그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게 내 작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르사유와 체르노빌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장소다.
최초에 베르사유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나? 복원을 통한 회귀를 기록하고 싶었다. 베르사유엔 네 명의 왕이 있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으며, 근대엔 역사박물관이 됐다. 한 장의 사진에서 두 왕이 만들어놓은 두 개의 문을 볼 수 있다. 한 사진 안에서 두 세기를 볼 수 있는 거다. 역사를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30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예상했나? 처음엔 3일이면 찍을 줄 알았다. 하하. 베르사유는 매해 복원 과정을 통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영원불멸의 삶이 날 매혹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흔적이 가득한 공간을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건축에서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 시선엔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 사람이 아닌 건축물을 찍는 이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건축 사진가라고 하지만, 난 거주지habitat 사진가다. 내가 찍고 싶은 건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기 때문이다. 초상으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았던 방을 찍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는 방을 꾸리는 건 총체적 자아의 발현이다.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날것, 무의식적인 누드이기도 하다.
왜 지금이 아닌 지나간 것, 과거의 흔적인가? 지금과 미래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 그렇다면 기억은, 늘 고통 속에 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으면 기억을 못 해도,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고 물으면 대개 바로 답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술에 에토스, 페이소스, 에로스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봤는데, 난 페이소스에 관심이 많다.
필름 카메라를 느린 셔터 속도로 찍은 뒤 합성해 시간이 고여 있는 공간을 찍는다. 인위적인 조명을 쓰지 않고 자연광만 사용해서 찍기 때문에, 한 컷을 20-30초 동안 찍는데, 그 순간 숨을 쉬지 않는다. 뭔가를 목격하고 숨을 참는 행위, 난 그걸 시간을 먹는다고 표현한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사진을 결정적인 순간의 포착이라고 정의했지만, 내게 사진은 축적되는 순간들의 도합이다. 비이성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렇게 모아놓은 숨을 나중에 몰아쉬는 것처럼 느낀다. 그럴 때면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
사진을 통해? 그 과정에서. 카메라로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건 내가 던지는 질문이고, 찍은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난 창작자가 아니라 매개다. 단지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요나스 메카스 감독 밑에서 일했다. 무빙 이미지가 아닌 스틸 이미지를 찍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지만, 사진은 한 면을 기록해 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을 층층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에 매혹됐다. 그래서 난 스스로 도상학자라고 생각한다.
요즘 찍고 싶은 장소가 있나? 나폴리의 버려진 교회들. 현시대에서 종교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부재를 사진을 통해 말하고 싶다. 브라질의 자율적으로 생긴 마을도 다시 한번 찍고 싶다. 그곳엔 건축가도 엔지니어도 없다.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다. 계획된 건축물이 많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서울에서 어딘가를 찍는다면? 한강변을 따라 집들이 쌓이듯 자리한 광경을 봤다. 옥수동쯤이었을 거다. 그곳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예지
- 포토그래퍼
-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