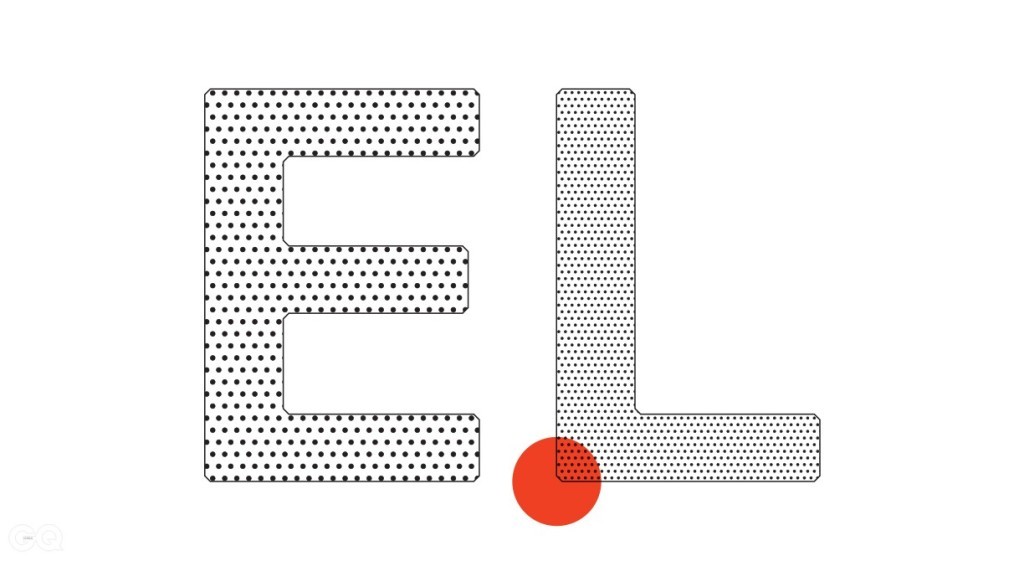월요일 오전 열한 시였다. 이번 주에 처음 거짓말을 한 그 시간.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
월요일 오전 열한 시였다. 이번 주에 처음 거짓말을 한 그 시간.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 주말에 뭘 하며 지냈냐고 누가 물었고, 나는, 토요일엔 벼르던 흑인문학전집을 다 읽었으며, 일요일엔 지구의 모든 술을 다 마셨다고, 지적이고도 마초적인 거짓말을 했다. 내가 한 건, 집 밖으로 한 뼘도 나가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눈 뜨고 누워 있다가, 책을 읽다 말다 하다가, 다시 잔 게 다였다. 그런데도 그에겐 산해진미를 대접하듯, 워커힐 테이블 위에서 춤추며 보냈다는 식의 공갈을 왕창 늘어놓았다.
나도 나를 이해한다. 누구라도 오늘 말한 하나의 사실에도 최소한 4분의 1쯤 가짜가 있고, 거짓말이란 숨쉬기처럼 인생의 당연한 일부니까. 이런 식의 과장은, 양육하면서도 좌절시키는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충격과 상처를 무릅쓰는 괜한 무리수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날 새로 소개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걸까….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나를 눈 멀도록 찬란한 모습으로 바꿔주길. 내가, 뼛속까지 위태한 사람이 아니라 모태부터 위대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길. 그러다 누가, 내 직업이 문화적으로 참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순 허풍…”그러면서도 아롱지는 쾌감에 정신을 잃는다. 무안해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한국 <지큐>의 영향력을 지정학적으로 과장하거나, 내가 행성에 남긴 족적의 크기와 너비가 얼마나 거대한지 가늠해주길 (속으로) 종용하기까지 한다. 겸손한 척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하는 일조차 고작 두 단어로 설명된다면 정말 화났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나의 도약을 알지도 못하며, 내가 어찌 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이 당장 온다. 아주 어색하게). 그런데, 내가 고치고 싶은 건 누구의 역사인가? 그들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지금의 위치는 불안한데 성공을 말해주는 건 외곽적 성취인 이 세대에, 스스로 최강의 존재로 보이기 위한 거짓말 스트레스는 일견 유명인사 집착증과 닮았다. (하지만 명성을 얻기란 너무나 쉽다. 앙드레 김이 살아 있을 땐 그를 조롱함으로써 주시받은 사람들이, 그가 죽고나자 앙드레 김 생전에 자기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자랑함으로써 또 주목받던 걸 보면….) 아무튼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운명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준비된 거만함으로 인생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거짓말만 제대로 한다면…. 각각의 개인은 벗겨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몸과 같다. 하지만 다들 옷가지가 담긴 가방을 계속 풀면서, 스스로 포장하고 변명하는 카드 게임을 벌인다. 성별 카드, 인종 카드, 중독 카드, 장애 카드, 질병 카드, 불우한 어린 시절 카드, 폭력적인 부모님 카드, 무시카드…. 그러다 거짓말이 점점 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대사는 난폭한 거짓말이라는 껍질로 싸여 있다.
누군가 케냐에서 산책하다가 엄청 큰 수사자하고 마주친 일을 들려줬다 치자. 그럼 상대는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고, 심지어 수사자 옆에 멸종된 줄 알았던 맘모스가 서 있더라고 말한다. 자가용 제트기로 튀니지에 갔던 비행 경험을 말하는 사람은, 멕시코 만류로 향했던 경험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베르사체 쇼를 보러 밀란에 갔던 얘기를 떠들라 치면, 그럼 도나텔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식이다. 이상한 일도 아니다. 트럭에 부딪혀 팔이 부러졌다고 짧게라도 말할라 치면 즉시, 전에 자기가 당했던 더 끔찍한 삼중 추돌, 척추 탈골 이야기가 돌아온다. 이어지는 순간의 고통을 참다가, 옆의 다른 사람이 더 압도적인 얘기를 막 꺼내놓으려 할 때 바짝 서둘러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야만 이길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놀라운 건 의사가 내 견갑골에 박혀 있던 식칼을 꺼낸 거지.”
거짓말로 자기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다가, 급기야 일백 번 고쳐 죽어도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둔갑한다. 샤넬의 희망을 가슴 가득 펼쳐 놓고, 럭셔리 상품의 반짝임이 개선된 자신을 비추길 원하는 건 차라리 순진하다. 가장 나쁜 예는, 매점만 들락거려놓고 그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대학 졸업장은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지식인 백 명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 보이게 하니까. 그 나이에 누가 대학교 이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겠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뻐기는 건 수능 몇 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지 않아? 대학교 졸업장에 껌뻑 죽는 치들이야말로 진짜 후진 족속아냐? 그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쨌든 사회적 자랑의 한도를 넘어 사실을 통째 왜곡하는 기술이 창피하고 면목 없는 거짓말인지, 일생을 밝게 떠받드는 방법인지는 원숭이도 알 것이다.
내 안의 한 사람은 나에게 아직도 희망을 보지만, 다른 이는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하지만, 잘생긴 친구가 부러워 죽을 것 같다 해도 그의 목을 뎅강 잘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을 순 없다. 이젠 내가 차세대 존 업다이크가 아니란 걸 알지만, 상관없다. 나는 우주에서 영원히 일회한 개인이며, 최후까지 독립적인 각자니까.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 (GQ 코리아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