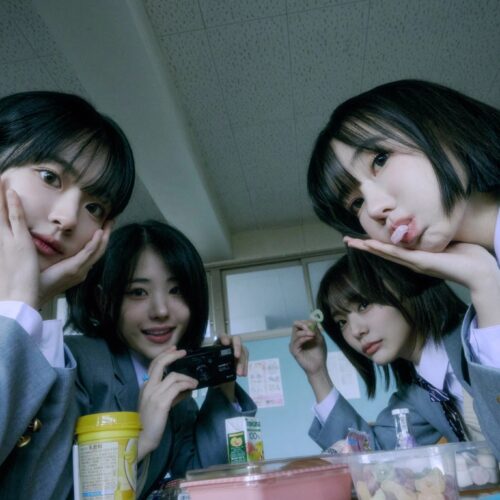메르데세스-AMG GT는 오로지 경주차의 순수함만을 추구했다. 벤츠 엔지니어 출신 창업자의 꿈이 반세기 만에 이뤄졌다.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해냈구나!” 메르세데스-AMG의 CEO 토비아스 모어스는 이 차의 프로토타입을 처음 몰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30년 후 이 차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SLS AMG와 더불어 스포츠카 세그먼트에서 메르세데스-AMG 브랜드의 돌파구를 연 주역으로 기억될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잡지를 덮었다.
호텔방에는 기자들을 위해 준비한 웰컴 패키지가 있었다. 그 속에 담긴 잡지는 메르세데스-AMG GT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다. CEO를 시작으로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차를 농밀하게 소개했다. 그런데 자동차는 사진으로 보고 기사로 읽어봐야 결국엔 겉핥기다. 맨눈으로 보고, 손바닥으로 쓰다듬고엔진의 울화통을 제대로 터뜨리면서 타이어의 때를 벗겨봐야 제맛을 알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기회가 왔다. 호텔 앞마당에 어젯밤 잡지에서 읽은 주인공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메르세데스-AMG GT다. 이 차의 실질적 맞수는 포르쉐 911 시리즈. 이 회사의 전작 SLS AMG는 슈퍼카였다. 고성능 차 브랜드는 후속으로 더 강한 모델을 내놓게 마련인데, 메르세데스-AMG는 현실을 선택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꾀했다. GT로 브랜드의 영토 확장을 꿈꿨다. 이번 시승의 출발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한 호텔이었다. 우리는 풍광 좋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의 해안도로를 따라 몬테레이 인근까지 달릴 예정이었다. 곧이어 코크스크루라는, 급경사 코너로 유명한 라구나 세카 트랙을 누빌 계획이다. 일요일 오전, 한가했던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반반한 외모와 괄괄한 성격의 GT가 떼 지어 달리면서 활발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실 사진으로 GT를 봤을 땐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그야말로 굉장했다. 까마득히 뻗은 앞코와 쫑긋 끊어 붙인 엉덩이의 조화가 예술이다. 차체 표면은 물수제비를 뜨고 싶을 때 심혈을 기울여 고르는 조약돌처럼 매끄럽다. 실내는 외모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면과 선이 과감하다. 입체적인 데다 번쩍거리는 부품도 많아 현란하다. 기어 레버는 조막만 하다. 주차와 전진, 후진, 중립으로 나뉘는 바이 와이어 방식이다. 살짝 위로 뽑아 오르내려야 한다. 조작감이 가볍고 단계가 뚜렷치 않아 처음엔 낯설게 느낄 수 있다. D컷 스티어링 휠은 림을 울룩불룩 주물러놨다. 손아귀에 딱 맞는다. 시트는 버킷 타입. 딱딱하리라 걱정했지만 우려보다 훨씬 편안했다. 가운데 부위엔 알칸타라를 씌웠다. 그래서 일단 몸을 얹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꿈쩍 않고 고정된다.
![[못 말리는 열정] M 자동차 회사의 신입 엔지니어 A는 레이싱이 좋았다. 성능을 화끈하게 높여서 경주에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반응은 미지근했다. 회의를 느낀 A는 창업을 결심했다. 사내 동료 M과 뜻이 맞았다. 두 자동차광은 번듯한 회사를 뛰쳐나왔다. 1967년 G란 지역에서 창업했다. 회사 이름은 둘의 성과 지역명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AMG의 시작이었다. 이후 AMG는 모터스포츠와 튜닝으로 명성을 떨쳤다. 으리으리한 휠과 치맛자락 같은 범퍼로 화려하게만 치장했던 튜너와 접근법이 달랐다. 레이싱 공식에 충실했다. 1999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엔지니어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진 메르세데스-벤츠가 AMG의 지분을 사들였다. 2005년엔 100퍼센트 자회사 메르세데스-AMG로 거듭났다. 공동 창업자 둘은 또 다른 미래를 찾아 각자의 길을 떠난 상태. 에르하르트 멜허(M)는 AMG가 지금의 둥지인 아펠터바흐로 옮길 때 회사를 떠났다.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흐트(A)는 자신의 이름을 딴 HMA란 레이싱 팀을 운영 중이다.](https://img.gqkorea.co.kr/gq/2015/02/style_55ed400d9e8b8.jpg)
[못 말리는 열정] M 자동차 회사의 신입 엔지니어 A는 레이싱이 좋았다. 성능을 화끈하게 높여서 경주에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반응은 미지근했다. 회의를 느낀 A는 창업을 결심했다. 사내 동료 M과 뜻이 맞았다. 두 자동차광은 번듯한 회사를 뛰쳐나왔다. 1967년 G란 지역에서 창업했다. 회사 이름은 둘의 성과 지역명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AMG의 시작이었다. 이후 AMG는 모터스포츠와 튜닝으로 명성을 떨쳤다. 으리으리한 휠과 치맛자락 같은 범퍼로 화려하게만 치장했던 튜너와 접근법이 달랐다. 레이싱 공식에 충실했다. 1999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엔지니어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진 메르세데스-벤츠가 AMG의 지분을 사들였다. 2005년엔 100퍼센트 자회사 메르세데스-AMG로 거듭났다. 공동 창업자 둘은 또 다른 미래를 찾아 각자의 길을 떠난 상태. 에르하르트 멜허(M)는 AMG가 지금의 둥지인 아펠터바흐로 옮길 때 회사를 떠났다.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흐트(A)는 자신의 이름을 딴 HMA란 레이싱 팀을 운영 중이다.
외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시야는 빠듯하다. 시트를 웬만큼 높이지 않는 이상 보닛 끝은 가늠하기 어렵다. 뒷유리도 납작하다. 하지만 철옹성에 둘러싸인 느낌이 싫지 않다. 이 차는 세단이나 SUV가 아니니까. 이제 출발이다. 기어 레버를 D로 옮기고 가속페달을 툭 쳐서 발걸음을 뗐다. 역시 움직임이 뻑뻑하다. 서늘한 긴장이 몰려들었다. 거리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된다. 음산했던 울음은 3,000rpm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포악스러워졌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꽁무니에서 총격전으로 착각할 만큼 요란하게 콩 볶는 소리를 냈다. 사운드의 향연은 진동과 함께 오감을 자극했다. 일부러 더 가혹하게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나자 피로가 몰려왔다. GT는 얌전히 몰거나 장거리 여정을 함께하기엔 너무 자극적인 이동수단이었다.
GT의 엔진은 V8 4.0리터 바이(트윈) 터보 가솔린이다. 터보차저는 실린더 뱅크 사이에 쑤셔 넣었다. 공간을 아끼고 효율은 높이기 위해서다. 엔진은 한 가지인데 출력은 GT 462마력, GT S 510마력으로 나눴다. 최대토크는 모델에 따라 1,600~5,000rpm의 넓은 구간에서 뿜는다. 따라서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면 곧장 불덩이 같은 토크를 와락 토해낸다. 최신 터보 엔진답게 반응은 즉각적이되 신경질적이지 않다. 힘은 늘 넘쳐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가속 시간은 GT가 4초, GT S가 3.8초다. 고성능 차에 익숙지 않은 오너라면 “오늘 사고 한번 치겠구나” 와락 겁이 날 만큼 폭력적이다. 하지만 그런 느낌도 잠깐일 것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금세 덤덤해진다. 무게중심 이동이 엄격히 억제된 차체 움직임 때문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곡면] 벤츠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하는 로버트 레스닉과 이야기를 나눴다. GT도 그와 디자인팀의 작품이다. 그는 “GT는 비율이 전부인 차”라고 정의했다. 20세기 초 실버 애로우Silver Arrow란 애칭으로 이름을 날렸던 벤츠 레이싱카의 비율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뜻이다. 그는 “벤츠 디자인은 비율→표면→디테일의 순서로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벤츠는 ‘극단적인 곡면Extremely Round’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GT의 표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운 직선이 하나도 없는 이유다. 또한 SLS와 GT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일단 크기가 비슷해요. GT는 SLS보다 오버행과 휠베이스가 각각 50밀리미터 짧을 뿐이에요. 너비는 똑같지요. 차체 높이는 GT가 2~3센티미터 더 높고요.” 하지만 성향은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가격으로 봤을 때 SLS는 슈퍼 스포츠카였어요. GT는 스포츠카입니다. SLS의 후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걸 윙 도어도 계승하지 않았어요.” 보통 벤츠의 신차 디자인 기간은 4년이다. GT는 3년 걸렸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 4~5개의 안을 만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여러 안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았죠. 물론 위험부담이 컸어요. 최종 승인 담당 임원이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다행히 GT는 흔쾌히 승인을 받았어요.”](https://img.gqkorea.co.kr/gq/2015/02/style_55ed400dcc7da.jpg)
[극단적인 곡면] 벤츠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하는 로버트 레스닉과 이야기를 나눴다. GT도 그와 디자인팀의 작품이다. 그는 “GT는 비율이 전부인 차”라고 정의했다. 20세기 초 실버 애로우Silver Arrow란 애칭으로 이름을 날렸던 벤츠 레이싱카의 비율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뜻이다. 그는 “벤츠 디자인은 비율→표면→디테일의 순서로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벤츠는 ‘극단적인 곡면Extremely Round’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GT의 표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운 직선이 하나도 없는 이유다. 또한 SLS와 GT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일단 크기가 비슷해요. GT는 SLS보다 오버행과 휠베이스가 각각 50밀리미터 짧을 뿐이에요. 너비는 똑같지요. 차체 높이는 GT가 2~3센티미터 더 높고요.” 하지만 성향은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가격으로 봤을 때 SLS는 슈퍼 스포츠카였어요. GT는 스포츠카입니다. SLS의 후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걸 윙 도어도 계승하지 않았어요.” 보통 벤츠의 신차 디자인 기간은 4년이다. GT는 3년 걸렸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 4~5개의 안을 만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여러 안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았죠. 물론 위험부담이 컸어요. 최종 승인 담당 임원이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다행히 GT는 흔쾌히 승인을 받았어요.”
기다란 앞코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스티어링 조작과 차체 코끝의 움직임 사이에 미묘한 시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방 잊게 된다. 스스로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 알아서 박자를 딱딱 맞추게 된다. 오후 늦게 도착한 라구나 세카 트랙에서 GT는 비로소 몸을 풀었다. 이 차의 핵심은 균형. 길쭉한 보닛엔 엔진, 뒤 차축엔 변속기와 구동축을 물려 균형을 맞췄다.
메르세데스-AMG의 균형에 대한 집착은 소재로 이어졌다. 섀시는 경량 합금, 트렁크 뚜껑은 주철, 차체 앞부분엔 마그네슘을 썼다. 프레임은 90퍼센트 이상을 알루미늄으로 짰다. 그 결과 차체 골격 무게를 231킬로그램에 묶었다. 엔진이 209킬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혹독한 다이어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프로펠러 샤프트도 무게 걱정 때문에 카본으로 만들었다.
메르세데스-AMG GT에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물씬 묻어 있다. 골수 엔지니어가 세운 튜너 시절의 혼이 그대로 살아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원칙은 칼같이 지키되 한계는 날카롭고 높게.’ GT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겸허해지는 차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서다. 가령 롤(좌우 기울임)과 피칭(앞뒤 끄떡임)이 거의 없어 타이어 부담이 크다. 이 차를 재밌게 운전하려면 타이어의 접지력 변화를 면밀히 읽는 감각이 필수다.
GT는 비율뿐 아니라 성향도 경주차의 순수함 그 자체를 꿈꾼다. 레이싱카의 정석에 충실한 밸런스로 운전자에게 짜릿한 희열을 안겨준다. 그래도 단서는 붙는다. 이 차에 걸맞은 정교하고 섬세한 운전이 뒷받침되어야 진가를 느낄 수 있다. 대충 몰아도 과장과 왜곡으로 우쭐하게 만드는 포르쉐 911과 가장 큰 차이다. 압도적 사운드와 박력을 앞세워 과잉반응을 유도하던 기존 AMG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빠르면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메르세데스-AMG GT의 다채롭고 화려한 실내. 센터페시아에 있는 네 개의 송풍구와 짧은 기어봉,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아 보이는 버튼들은 이 차의 실내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조약돌같이 매끈한 외관과는 조금 다른 언어. 하지만 이런 식의 충돌이 한 대의 차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메르세데스-벤츠와 버메스터의 오디오 시스템은 최고의 궁합을 보장한다.
- 에디터
- 컨트리뷰팅 에디터/ 김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