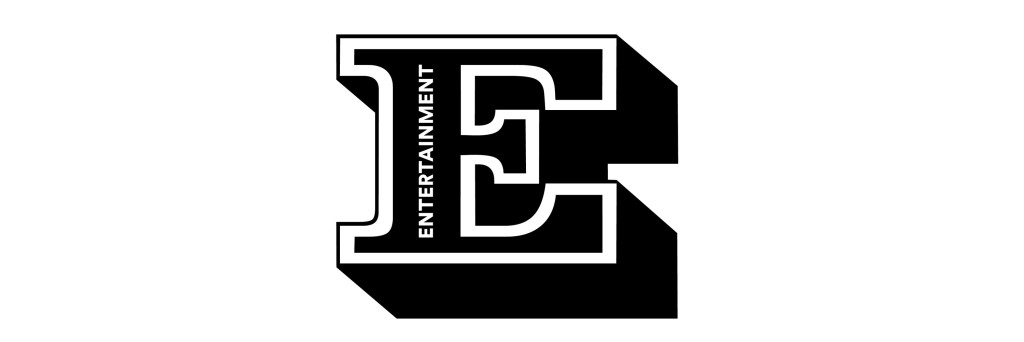하지만 추억팔이는 똑같아야 팔린다.
2015년 벽두에 1996년 터보 노래가 들리는데 영문도 모르고 “어, 좋은데?” 소리가 튀어나왔다. 곧장, ‘터보를 좋아했던가?’ 생각해봤더니 기억 속엔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꺼렸던 정황이 다분했다. 왁자지껄 호프집에서 이때다 싶을 때마다 경적처럼 울리던 자발맞은 비트, 그리고 김종국의 가는 목소리 “해피 버쓰데이 투 유, 해피 버쓰데이 투 유, 해피 버쓰데이 오 마이 프렌드, 해피 버쓰데이 투 유~.” 정녕 피하고 싶었던 노래. 그런데 어쩌다 2015년 길거리에선 종소리를 대하듯 귀 기울이게 되었나?
‘토토가’ 신드롬을 접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터보가 좀 씹어 뱉듯이 랩을 하잖아. 그게 어쩐지 요즘 노래같이 들리는 거 아닐까? 옛날 노랜데 세련됐네, 하는 식으로. 어쨌거나 사람들은 새거 좋아하잖아.” 그럴지도. 유난히 꺼렸던 터보가 유난히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라면 어디까지나 논리보다는 감성의 차원일 터. 그런데 그 감성이란 놈은 언제나 좀 문제를 일으킨다. 정확하긴커녕 거짓이나 오해가 섞이기 일쑤다. “나 좋으면 장땡이지”라는 주장은 언제나 정력이 넘친다지만….
‘토토가’는 반가웠다. 즐거웠고, 애틋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오류를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추억’이라는 말. 고민할 것도 없이 골라잡아 쓰기 쉬운 표현이지만, 연신 카메라에 잡히는 방청객만 해도 90년대를 ‘추억’할 입장으로 보이진 않았다. 2015년 25세인 사람이 1995년 노래를 ‘추억’이라 포장하는 게 말이 되나? 악의라곤 없을 테지만 결국 그건 거짓말인 줄도 모르는 거짓말 아닌가? 언젠가 <콘서트 7080>에서 강수지가 ‘보랏빛 향기’를 부르는데, 객석의 수많은 중·노년 여인들이 손뼉을(<가요무대>에서나 보던 장면) 쳤다. 그 기이한 풍경이라니.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구분할 거리도 못된다는 듯이, 새것이 아니라면 싸그리 ‘과거’로 통합하고, ‘추억’이라 이름 붙여 판다. 보는 이쪽도 마찬가지. 그게 유행이라면, 저 유명한 ‘대세’이기만 하다면야 덩달아 능동적인 관객이 되고 열정적인 소비자로 변신한다. 대세란 그저 따르는 것일 뿐, 다른 선택지는 모르거나 아예 없으므로.
유행의 미끼는 결코 개인을 향하는 법이 없다지만, 유난히 여기에서의 유행이란 우루루 몰려가 승전보를 외치는 식으로만 구획된다. 눈치 보고, 올라타고, 소리친다. 대세를 따랐으니, 그걸 따른 ‘내가 또한 대세’라며 우쭐해한다. ‘토토가’ 이후 라디오에선 수없이 ‘그 노래’가 반복되었다. 아니, 그 노래‘만’ 나왔다. DJ들은 추억이니, 공감이니, 소통이니 반복하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를 향했다. 골백번 고쳐 물어도 답은 같다. 결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고, 하나일 수도 없다.
‘토토가’ 이후 한결같이 “그때가 좋았지” 퉁치는 90년대만 해도, “나는 다르다”는 말이 힘을 썼다. 그 역시 유행이었을망정 말이다. 그 때 각각 빛나는 줄 알았던 개인이 어느새 너와 나, 10년과 20년도 구분할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가 된 건 아닌가? 터보의 노래를 종소리처럼 반기다가도 문득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유다.
- 에디터
- 장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