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소개하는, 여섯 권의 새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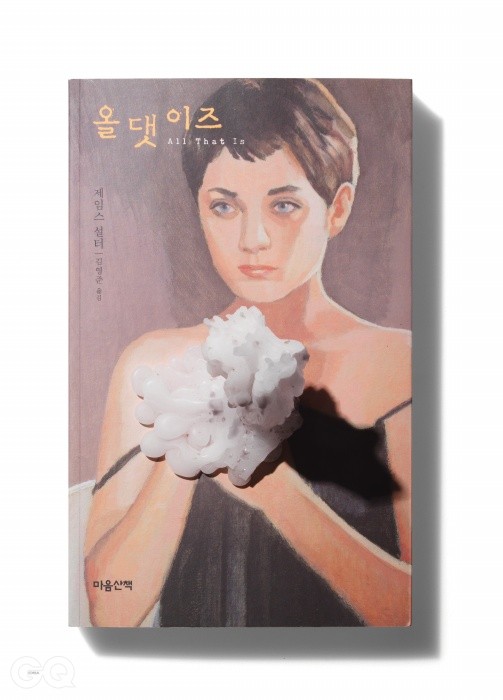
제임스 설터와 그의 시대 제임스 설터가 지난 6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장편소설 <올 댓 이즈>는 그의 유고작이다. 무겁기보다 가벼워서, 그다운 마지막 작품이지 싶다. 양초처럼 뜨거운 시절을 지나 차갑게 굳어버린 삶, 다만 모두 무너져 내린 자세를 하고도 이해를 구하기보다 그저 좋은 것을 찾고 지탱해나가는 삶은 그의 소설 속에서 여전하다. 그의 방법적 관심이 인상적인 신의 연출보다는 스케치에 있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는 그녀가 미웠다” 같은 단문은 그가 늘 쓰던 것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좀 더 파편적으로 읽힌다. 감정에 비해 문장은 너무 작고, 기차의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너무 빨리 다른 일이 몰려들어 더욱 작게 느껴진다. 제임스 설터는 <파리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서정적인 표현에 덜 의존하려 노력해왔어요. 그것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약간 더 깎아내고 조금 더 졸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그의 결론에 동감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일감 “인간이 한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직업이 그의 모습이지.” 수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택시 드라이버>의 대사다. 인상적인 대사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일을 하기에 누구나 건드리는 소재를 담은 덕이다. 알렉상드르 줄리앵은 ‘인간’이 직업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라는 직업>에서 하루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자신의 삶, 장애인의 삶을 다룬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통의 대처에 관한 한 가지 전언을 남긴다. <나는 생겨먹은 대로 산다>는 이 책과 반대편에서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뭘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직업인으로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권리를 누리라는 것이다.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는 앨리스 먼로, 제이스 캐럴 오츠, 제임스 설터에 이르는 ‘일급 작가’들이 일을 소재로 쓴 작품을 모은 단편소설집이다. 일하면서는 읽지 말라고 75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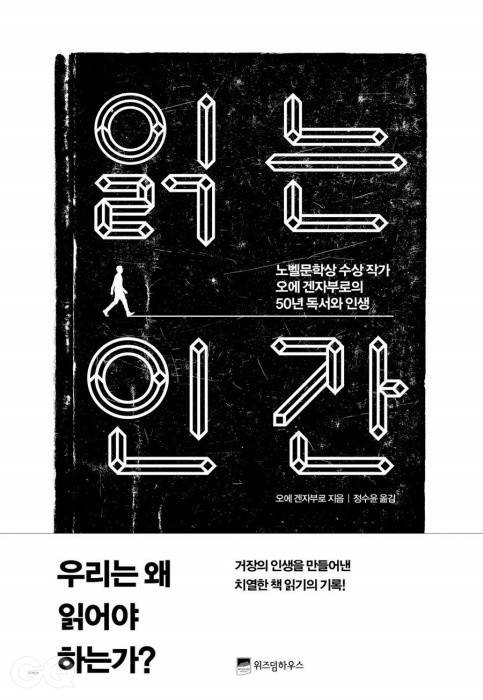
이별의 책 오에 겐자부로는 “‘제 인생의 책’이라 할 만한 이런저런 책들과 이별하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러분께 그 책을 건네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러보고자 합니다”라고 서두에서 말한다. 말하자면 그가 지금까지 읽어온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정작 독서 목록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의 기억이 아직까지 신선하고, 한 권의 책에서 자신의 삶과 정치, 인간을 두루 살피는 맥락은 지나치게 풍부하다. 무엇보다 책에서 시작해 책으로 끝나는, 빼곡한 책의 인생이 귀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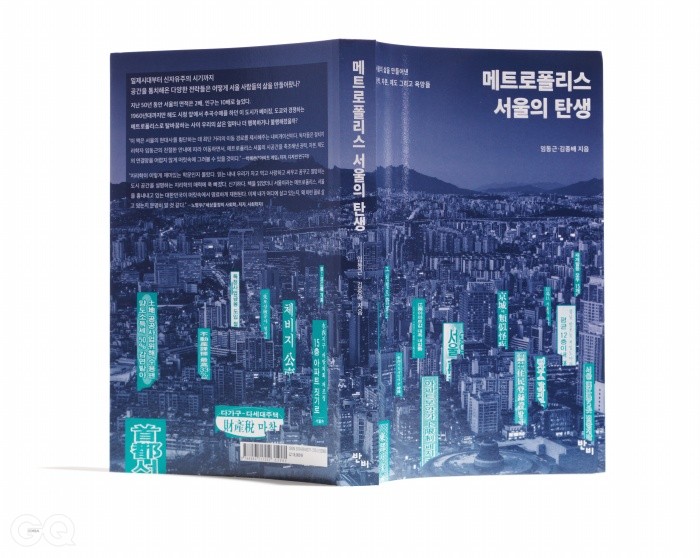
서울살이 시시평론가 김종배와 지리학자 임동근이 서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거대 도시 서울을 다루지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은 탁자 바깥을 넘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당대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를 추적하는 방법은 논문이 아니라 인터뷰다. 김종배는 때로는 독자의 눈높이를, 때로는 정치적인 핵심을 짚어내고, 임동근은 서울의 정치지리학적 난맥을 차분하고 정연하게 풀어낸다. 1949년의 지방자치법부터 신자유주의하의 도시계획까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모두 답답한 서울이 일목요연해진다.
- 에디터
- 정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