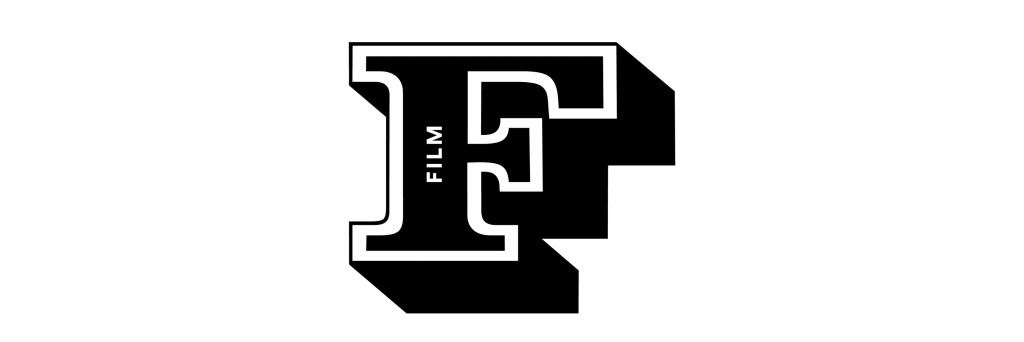언젠가부터 스크린과 TV에 ‘센’ 연기가 넘친다. 모두가 연기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처럼.
재작년, <여왕의 교실> 제작 보고회. 배우 최윤영은 촬영하며 아이들에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배우 고현정은 반대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건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제대로 된 어른이 돼서 우리가 많이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후에 고현정은 좋은 어른이 되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고,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4일 개봉한 영화 <허삼관>에서 허삼관(하정우)의 첫째 아들 일락을 연기한 열네 살 남다름은 수많은 배우 사이에서 홀로 돋보인다. 과연 아역 배우라서 너그럽게 평가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남다름의 연기가 다른 배우들과 정말 달라 보였던 건 혼자 남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억지가 없었고, 무난했으며, 자연스러웠고, 심성 바른 아이로 영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만약 <허삼관>을 보고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낀다면 성인 배우들의 연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는 연극 같다. 수많은 배우가 문어체로 이야기하며 소위 센 연기를 한다. 과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실 ‘오버’하는 연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배우의 격한 연기가 자연스럽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캐릭터를 설명할 충분한 시간은 꼭 필요하다. 유명 배우일수록 관객은 배역이 아니라 배우를 인식하기 마련이다. 만약 기존의 이미지와 차이가 큰 배역을 맡았다면 어쨌거나 전작의 이미지를 깨는 시도와 시간이 꼭 필요하다. <허삼관>에는 수많은 배우가 출연한다. 전혜진, 장광, 성동일, 주진모, 이경영, 조진웅, 정만식, 김성균…. 등장하는 순간 배우가 지닌 기존의 이미지를 단박에 떠올릴 수 있다. 다행인 건 대부분 관객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맡은 역할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허삼관>에서만 존재하는 그 역할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배우가 너무 많아서 캐릭터와 배우 간의 간극을 매울 만큼의 물리적인 시간이 꽤 부족하다. 조연 배우도 감독(이면서 주연배우인 하정우)도 캐릭터와 배우의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하정우, 하지원도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던 다른 배역이 쉽게 떠오른다. 오직 남다름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락으로 보인다. 어떤 편견이나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다. 성인 배우들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다른 영화에서도 ‘잘’하던 그대로다. 그러곤 빠르게 사라진다. 자신들의 몫을 다했다는 듯이 황망할 만큼, 아주 센 임팩트만 남긴 채.
그 임팩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요즘 배우들에겐 시선을 단박에 빼앗는 기술이 예전보다 중요해졌다. 영화나 드라마 모두 그렇다. 드라마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잘게 쪼개져 클립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사실 모든 미디어는 빠르게 인스턴트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영화도 위기를 느꼈다.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지루하지 않게’ 여러 번의 시나리오 수정을 거친다. 감독의 뚝심으로 만들어지는 상업영화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개봉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고집을 부렸다. 덕분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작 초기 단계에 투자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감독과 제작자는 한 메이저투자 배급사를 만난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한 메이저 투자 배급사로부터 불치병, 시체, 자살 등의 소재를 권유 받았다. (<씨네 21>, ‘아기자기 오밀조밀 따스함을 담다’) 삼거리 픽쳐스의 엄용훈 대표와 김성호 감독은 본래의 결말과 힘을 빼기 위해 3년을 버텼다. 결국 영화는 의도대로 ‘개를 잘 돌려주는’ 결말을 지켜냈다.(하지만 대형 배급사에 밀려 흥행에 실패했다. 많은 사람이 상영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을 지지한다.) 아주 상식적이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끝을 향해 가는 이 영화에 ‘오버’라곤 없다. 감독은 원작 소설의 주인공 조지아를 두 캐릭터로 나누고 둘의 앙상블이 하나처럼 보이게 했다. 의도대로 이레(지소)와 이지원(채랑)이 끌고가는 호흡은 이상적이다. 그건 아역 배우들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너그러운 기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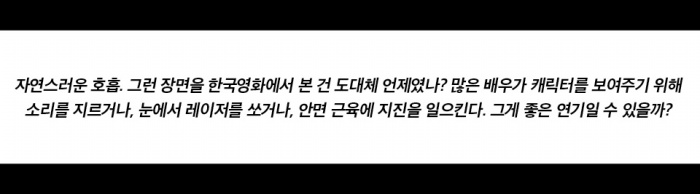
꼭 마이클 케인의 가르침대로 연기하는 것 같다. “영화에서 매 순간 잠재적 힘을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배우의 반응입니다. 상대역의 대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목소리를 키우거나 무턱대고 동작을 크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명배우의 연기수업>, 마이클 케인. 2009년, 바다출판사)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두 여배우(라고 꼭 부르고 싶다) 이레와 이지원은 서로의 대사를 들으려고 한다. 그 진지한 ‘합’은 근래 어떤 한국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앙상블이었다. 배우들이 서로를 다듬어주는 완벽한 배려, 자연스러운 호흡. 그런 장면을 한국영화에서 본 건 도대체 언제였나? 많은 배우가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눈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안면 근육에 지진을 일으킨다. 그게 좋은 연기일 수 있을까? 마이클 케인의 대답. “좋은 영화 연기란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모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술 취한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술 취한 사람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조야한 연기라면 술 취한 상태를 보여주려고 온데를 갈지자로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배우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알 듯이 영화 연기는 자연스러운 것이 관건이다. 그건 연극영화과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메소드 연기’의 시작이고, 배우가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연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왜 센 연기가 많아졌을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한국 영화계에 떠도는 이야기다. 스태프에게 들은 푸념, 하나. “영화 촬영 후반부의 오랫동안 준비한 폭파 장면인데, 주인공이 자신이 멋있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NG를 내는 거예요. 테이크를 할 때마다 제작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모두 지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신의 연기가 돋보이는 쪽으로만 요구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스태프들은 다 알죠. 결국 배우가 원하는 대로 찍었어요.” 작년에 영화를 찍은 감독에게 들은 푸념, 둘. “한 중견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할 때 전작을 함께한 감독이 말렸어요. 상대 배역의 연기를 ‘따먹는’ 연기만 한다는 거예요. 리액션을 과장하거나 모든 쇼트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었어요. 저와의 작업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모든 건 컨트롤하지 못한 제 책임이지만 그렇게 세게 연기하면 함께 쇼트에 붙는 후배 배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기싸움은 어느 영화 현장에나 있는 것이지만, 한참 선배 배우가 까마득한 후배 연기를 ‘따먹으려’고만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반면 배우 시선에서 본 반박도 있다. 하나. “한 영화에 주연급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 영화를 찍을 때 배우끼리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스스로 자신의 연기를 챙기지 않으면 편집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 더! 더! 보여주고 싶은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부터 문제라는 반박, 둘. “대형 제작사의 기획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상업영화 자체의 수준이 고만고만해졌어요. 그러니 영화가 점점 더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배우가 독특하거나 공감 가는 캐릭터로 센 연기를 보여줬을 때, 관객들은 연기를 ‘잘한다’고 말해요. 물론 예전에도 ‘신 스틸러’라는 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신선한 플롯 위에 살아 있는 캐릭터가 있고, 그에 잘 맞는 배우의 연기가 더해졌을 때예요. 이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영화를 기획할 때 부터 새로운 플롯이나 상상력이 거세당하니까 배우 스스로 캐릭터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를 존중하는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케인도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말했다. “크고 요란스러운 동작으로 장면을 빼앗는 배우를 만나면 저는 그 사람 밑으로 깔립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 배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바보처럼 보여버리죠.” 과연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
하필 <밀양>에서의 송강호의 연기가 떠오른다. 쇼트 밖에서건 안에서건, 전도연의 뒤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단지 뒤에서 어슬렁거릴뿐이었다. 장면의 일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어사무사하지만, 사라지면 천장이 무너져버리는 벽과 같은 연기. 그가 이창동 감독에게 “한 발짝 더 물러서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이제는 미담으로만 남았나? 채플린의 말. “연기를 잘하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눈물보다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관객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 실제 상황보다 뛰어난 연기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들만 진짜 연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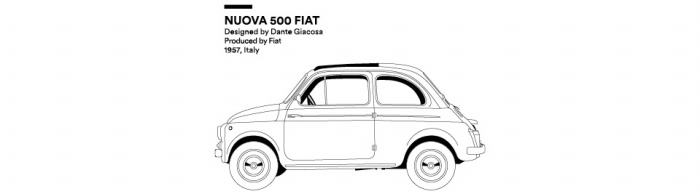
최신기사
- 에디터
- 양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