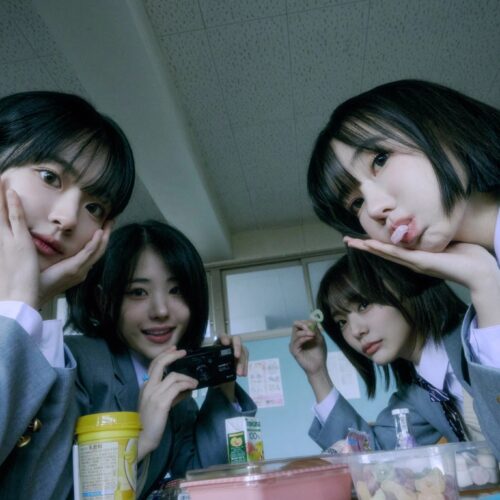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을 향한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꾸준히 베토벤에 천착해온 김선욱은 침착하게 완벽을 추구한다. 한편, 임동혁의 피아노는 지금도 풍성하며 점점 성숙하는 중이다. 시간은 흐르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세 명의 남자 피아니스트는 여전히 피아노와 마주 앉는다.
노년의 미남을 연기하는 박근형과 미남을 연기하는 장동건과 전에 없던 미남을 연기하는 송중기가 있다. 대중문화계는 그렇다. 차세대가 있고 세대교체가 있다. 신체가 곧 매체인 모든 예술 장르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연극배우도, 몸이 악기인 오페라 가수도 마찬가지. 반백의 머리로 소년을 노래하며 연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음악만 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차세대의 부상이 세대교체와 동의어일 수는 없다. 클래식 연주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년이 긴 피아니스트의 세계는 더욱 그렇다. 아흔 살의 피아니스트와 스무 살 콩쿠르 스타의 연주가 서로 다른 가치로서 공존하고 소비된다. 이제는 고인이 된 피아니스트 알도 치콜리니가 신보를 내놓았을 때 그의 나이 여든여덟이었다. 음반 재킷을 펼치면 얇고 주름진 피부로 덮인 노인의 두툼한 손이 제일 먼저 보였다. 이미 50대에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녹음한 치콜리니가 신보를 위해 선택한 소나타는 K331ㆍ280ㆍ333.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치콜리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차르트는 내게 이롭다. 나를 살게 한다.”
그 반대에 놓인 기억은 치콜리니의 신보보다 몇 년 앞선 2009년 1월의 것이다. 열다섯 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 무대에서 리스트 ‘단테 소나타’를 연주했다. 그해 봄이면 중학교 3학년 교실로 등교할 소년.
악보에 나타난 음표와 지시어만 따른다고 리스트의 사랑을, 단테의 지옥과 천국을 표현할 수 있을까? 조성진의 연주는 이런 의구심을 말끔히 걷어내며 내게 분명 리스트와 단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딱 그만한 소년이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말’로 들려줬다면, 혹은 어른처럼 연기했다면 내 마음이 움직였을까. 음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음악은 위대하며, 음악을 한다는 것도 위대한 일임을 소년은 음악으로 전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 임동혁·김선욱·조성진, 세 사람에 대해서다. 2000년대 초반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여성 팬덤을 독식한 임동혁, 2000년대 중후반 ‘순수 국내파’라는 타이틀로 언론을 장식한 김선욱, 그리고 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침체된 클래식 음악 시장의 구세주로 비친 조성진까지. 그들의 뜨고 짐은 한때의 피상적인 현상임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서두에서 밝혔듯 피아니스트의 정년은 길고, 그들이 맡을 ‘배역’은 나이와 무관하며, 그래서 차세대는 있으되 완전한 세대교체는 없다. 오히려 클래식 음악 산업계가 작아지고 차가워질수록, 음악가 각자의 뚜렷한 개성은 더욱 요구되며 공존은 더욱 공고해진다.
음악을 쥐어짜는 삶에 대하여
언젠가 서른을 앞둔 임동혁에게 팬덤이 여전한지 묻자 그는 “선욱이가 등장하면서 다 지나갔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동혁의 팬이 김선욱의 음악을 똑같이 좋아할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너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김선욱의 팬이 조성진으로 쉽게 옮겨가느냐? 절대 아니다.
이들은 각각 1984·1988·1994년에 태어났다. 임동혁 다음에 누가 있을까 싶을 때 김선욱이 등장했고, 김선욱을 이을 누가 없을 것 같다 싶을 때 조성진이 등장했다. 음악계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난 인재들이었으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하나같이 콩쿠르였다. 김선욱은 2006년 열여덟 살에 리즈 콩쿠르에 우승하며 종합 일간지의 문화면을 채웠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 우승하며 그 어렵다는 ‘네이버 메인’에 올랐다. 임동혁은 이들 셋 중에서 가장 강렬한 ‘콩쿠르 스타’다. 콩쿠르에 관해서라면, 그는 할 말이 많다.
임동혁의 수상 경력은 길고, 화려하고, 굴곡지다. 1996년 열두 살 임동혁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최연소(주니어 대회의 최연소다!) 2위에 올랐다. 이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트로피를 쌓아가던 소년은 2001년 프랑스 롱 티보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해, EMI와 전속 계약한 가장 어린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3년 임동혁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하고,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이 그에게 수여한 3등상을 거부한 것이다.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심사 결과에 불복한 열아홉 살 피아니스트. 콩쿠르 시스템, 그 근간을 흔드는 존재로 비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클래식 음악계의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콩쿠르는 그 결과에 실력뿐 아니라 정치력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임동혁에게 그때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냉소적으로 답했다.
“어디서든 한 번은 터졌을 일이에요.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콩쿠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최악이고, 그 다음은 더 최악.”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직후인 2003년 가을, 임동혁은 거처를 독일 하노버로 옮겨 아리 바르디와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오랫동안 레프 나우모프에게 배웠다. 스물한 살, 하노버 생활은 정말 따분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집 주변에 사슴이 노니는 멋진 환경이었다. 하지만 사슴은 임동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 하노버는 그에게 힘들게 연습한 기억만을 남겼다. 대학 과정을 공부한 모스크바 음악원과는 달리 하노버에서는 전문 연주자 과정을 밟았다. 수업은 전혀 없고 레슨만 했다. 사람이 미친 듯이 그리워지는 산속 오두막집에서 사람 구경은 못하고 연습만 한 시절이었다.
2005년 임동혁은 쇼팽 콩쿠르에 도전한다. 그와 콩쿠르는 다시 스캔들이라는 뜨거운 아이를 낳았다. 결선 무대에서 임동혁의 피아노에 조율 기구가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임동혁은 형 임동민과 2위 없는 공동 3위에 올랐다. 우승은 라파우 블레하치에게 돌아갔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이후 30년만에 등장한 콩쿠르 주최국인 폴란드 출신 우승자였다.
“라파우 블레츠치가 워낙 잘 쳤고 1등 하는 게 맞아요. 블레하치의 실력에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콩쿠르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블레하치가 무대에 나오면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립 박수가 나왔죠. 시상식에서 폴란드 대통령은 “드디어 우리의 30년 염원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이라면, 국내가 아닌 국제 콩쿠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고요. 제가 결선 곡을 연주했을 때 피아노 안에 조율 기구가 들어 있었던 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었어요. 사실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알았죠. 건반이 무거웠거든요.”
임동혁은 1악장을 끝내고 조율사를 불렀다. 수습 후 2악장이 이어졌다.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피아노의 이상을 알아챘다면 연주를 끊어도 될 일이었다. 굳이 1악장을 끝까지 완주한 이유는 뭘까. “저 녀석 또 논란 만들려고 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단다.
쇼팽 콩쿠르 이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음악 외적 즐거움이 폭발한 시기다. BMW Z4를 첫 차로 가졌고, 아우토반을 달리고, 그걸로 신문에도 실렸다. 임동혁은 2007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출전해 1위 없는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너무 놀기만 하다 보니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할 줄 아는 게 콩쿠르밖에 없어서 다시 그걸 택했다고 임동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미시적으로 보면 콩쿠르가 강제적 동기유발 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막연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음악가라면 콩쿠르가 “가장 확실한” 동기유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임동혁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콩쿠르를 대체할 동기유발 장치를 마련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답변에 앞서 오랜 침묵에 빠졌다.
“그게… 늘 고민이에요. 콩쿠르가 음악가에게 언제까지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음악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롱 티보 콩쿠르에 나가기 전만 해도 사람이 순진했거든요. 연습 열심히 하면 언젠가 유명해지고,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막연한 믿음이 충분한 동기가 됐어요. 그러나 피아니스트라고 흙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을 열심히 하지만 그 이유가 성공과는 무관하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2007년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임동혁의 마지막 출전이 됐다. 그가 세계 유수 콩쿠르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여 년, 국제 무대에서 한국 피아니스트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콩쿠르 결선 주자 명단에 한국인의 이름이 두셋 포함돼 있는 건 일반적인 일이 됐다. 2001년 임동혁이 롱 티보에 나갔을 때, 그는 20명 본선 진출자 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예선 통과 48명 중 한국인은 고작 4명이었다. 임동혁 스스로가변화를 느낀 건 2006년부터다. 쇼팽 콩쿠르와 차이콥스키 콩쿠르 사이 정도. “선욱이가 등장하면서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때부터 진짜 한예종 파워가 느껴졌고요.”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박용완(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일러스트레이터
- 홍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