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한 <GQ>의 의견 혹은 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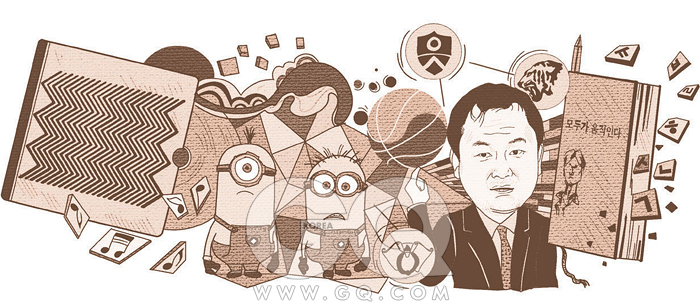
크레용팝과 ‘원 히트 원더’의 위력적인 한 방 ‘원 히트 원더’란 딱 한 곡을 히트시키고 사라지는 뮤지션, 또는 그 노래를 뜻하는 표현이다. ‘원 히트 원더’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음악 신이 건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콘셉트든 음악이든 새롭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 기존 틀을 파괴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내 음악 신은 ‘원 히트 원더’가 나오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돌에는 팬덤이 따라붙게 되어 있고, 기획사의 힘이 센 상황이라 일단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밀어붙이고 지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다. 오히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 히트 원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기를 얻는 노래가 불쑥불쑥 나왔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단 한 번의 무대가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고 오디션의 판도를 뒤흔들곤 했다. 강승윤, 버스커 버스커가 대표적인 경우다. 크레용팝의 ‘빠빠빠’의 지향점은 결코 ‘원 히트 원더’가 아니겠지만, 이미 사람들은 ‘빠빠빠’를 ‘원 히트 원더’처럼 즐기고 있다. 뮤지션보다 노래, 노래보다 후렴구, 후렴구보다 후렴구의 안무, 후렴구의 안무보다(또는 함께) 그들의 이미지가 앞선다. 어쨌든 파괴력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빌보드는 얼마 전 크레용팝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며 ‘빠빠빠’를 ‘강남 스타일’과 비교했다. 싸이는 ‘젠틀맨’으로 선전했으니, 그를 완벽한 ‘원 히트 원더’라 말할 순 없다. 하지만 ‘강남 스타일’이 소비되는 방식, 인기를 얻은 경로야말로 ‘원 히트 원더’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본질적인 형태의 것이었다. 짧고 뜨겁게 즐기고 그 다음은 글쎄.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팝이란 음악의 본래 역할, 그 순수에 가까운 게 아닐까? ‘빠빠빠’는 올해 나온 그 어떤 노래보다 오래 기억될 것이다. 유지성
김언의 새 시집이 겨냥하는 ‘말’은 뭘까? “소설을 쓰자”고 했다. <소설을 쓰자>는 “시가 아닌 것으로서의 시”를 쓰자는 의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부정으로부터도 벗어난다. 부정을 통해 말의 연쇄를 일으키지도, 비문이 시의 동력으로서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문장은 다음 문장에 의해 확장되지만, 목표가 각각의 단절에 가깝다는 점에서 김언의 세계는 어떤 전환점을 맞은 듯하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봉사하지 않는 “모두가 움직이는” 세계. 하지만 시집 <모두가 움직인다>가 기묘한 것은, 이 단절 속에서 하나의 시가 다른 시를 향한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서 ‘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팔을 날개처럼 휘젓는 요란한 이미지는 시끄럽게 흘러가는 물소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각의 시적 대상, 즉 모두가 움직이면서 한 편의 시를 떠미는 듯하다. 제각각이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미노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김언이 천착하는 ‘말’, ‘너과 나’ 사이의 이상적인 말일지도 모르겠다. 정우영
와인 콜키지 무료를 내붙인 식당이 많아지는 현상이 과연 좋을까? 주로 양곱창 전문점이나 한우구이 전문점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와인 콜키지 무료를 선언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 규모가 큰 이탤리언 레스토랑도 하나둘씩 와인 반입을 무료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와인 리스트가 충실하지 못한 식당의 경우 와인 콜키지 무료가 손님을 끌어오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콜키지 무료 확산이 장기적으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술에 쓰는 돈은 야박할 정도로 적다. 한식에 소주를 곁들이는 건 자연스럽지만, 양식 레스토랑에선 선뜻 와인 주문을 하지 않는다. 비싸고 어려워서겠지만, 요리를 즐기는 것만큼 와인을 주문하고 곁들이는 즐거움도 상당하다는 걸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스토랑의 주요 수익원이 술과 와인인 걸 생각하면, 우리의 이런 문화는 결국엔 레스토랑 메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문을 닫는다. 좋은 레스토랑이 수익 구조가 무너져 사라지는 걸 너무도 많이 봤다. 손기은
지금은 소형 수입차 시대? 포문은 폭스바겐 폴로가 과연 화끈하게 열었다. 2천4백90만원이라니. 폴로는 알찬 차다. 그 이상이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다. 폭스바겐 감성이 살아 있고, 연비는 18.3킬로미터에 달한다. 골프를 사려고 매장을 찾은 사람이 폴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풍문도 들려온다. 7세대 골프 출시 이후 폴로 판매량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시장은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했다. 피아트500은 그 자체로 재기발랄하고 예뻤지만 가격이 좀 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피아트500을 4백50만원, 500C를 2백만원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7월 전시장 방문객 수와 판매는 2배 이상 늘었다. 8월에도 같은 내용의 판촉을 이어갔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가격 책정과 마케팅이었다는 뜻이다. BMW 미니는 2천5백90만원짜리 미니 오리지널을 2천 대 한정으로 출시했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5백 대가 예약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클래스를 막 출시했다.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마음은 더 큰 판에 있다. 국산차 업체가 필요 이상의 옵션을 추가해서 가격을 높인다는 여전한 불만과 품질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은 오래됐다. 마음이 떠난 판에서 실속을 찾다 보면 좀 작은 수입차가 눈에 들어오게 마련인 시장이다. “흰색 국산 중형차를 샀더니 강남역에서 택시인 줄 알고 누가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더라”는 말과 “폭스바겐 골프를 몰아보고 나서야 운전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사이에 있는 시장의 마음을, 국산차 업체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정우성
나쁜 영화가 없다 한국영화가 나쁘지 않다. 만듦새가 대부분 괜찮다. 쇼트와 쇼트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플롯이 꼬인다거나, 말도 안 되는 대사로 시퀀스를 마무리하는 영화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한데, 이런 말을 꺼내본다. “좋고 낡은 것보다 새롭고 나쁜 것.” 과연 새롭고 나쁜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완성도보다 전혀 새로운 문법으로 호기롭게 만든 영화 말이다. 아주 소수의 영화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기로운 도전은 줄어들 수밖에. 차이밍량의 주장. “나쁜 영화는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는 영화이고, 좋은 영화는 자신의 내일을 걱정하는 영화다.” 그의 말은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영화보다 사적으로 고민하는 영화가 낫다는 말이겠지만, 정말 지구 종말을 걱정하는 사이 영화에 대한 고민을 멈추게 되는 건 아닐지. 양승철
아프니까 주연이다 KBS 월화드라마 <굿닥터>의 주인공은 자폐증의 일종인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다. SBS 수목드라마 <주군의 태양>의 주군, 소지섭의 비밀은 난독증이다. 최근 종영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졌다. 모두 어릴 적 겪은 사건에서 비롯된 증상이다. 역할만 다를 뿐, 밤 10시만 되면 채널 이곳저곳의 주인공들은 월화수목 트라우마와 싸우기 바쁘다. 20부 내외에서 이야기의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미니시리즈의 특성 때문에, 초반부터 강한 캐릭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에 성격을 부여하는 사건이 모두 사고로부터 비롯되어야 할까? 세 드라마의 주인공이 겪은 트라우마가 공교롭게도 모두 부모와 관계가 있다는 건 상상력을 탓해야 할 일이 아닐까? 지금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주인공이 없다. 장승호
- 에디터
- 양승철, 손기은, 유지성, 정우영, 정우성, 장승호, 장우철
- 기타
- ILLUSTRATOR/ 김종호(KIM, JONG 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