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반 정도만 맞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만이 타인을 조롱할 수 있다. 그러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래?” 되묻는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 싫은 말, 검증되지 않은 말이 공공의 영역으로 파고드는 일은 이제 너무 쉬워졌다. 언론사는 이름난 사람의 자극적인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기꺼이 퍼뜨릴 준비가 돼 있다.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바이라인엔 기자 이름 대신 ‘온라인 이슈팀’ 같은 모호한 이름이 쓰여있다. 그 이름 뒤에서 죄책감을 던다. 사실상 익명으로 달 수 있는 댓글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기사를 바탕으로, 포털은 확대 재생산과 이슈 검색에 최적화돼 있다. 그러다 이 조직적인 시스템이 개인을 향하면? 거의 영원한 조리돌림의 근거가 완성된다.
가까이는 개그맨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가 팟캐스트 ‘옹꾸라’에서 했던 말이 있었다. 멀리 가면 개그맨 김구라의 이름을 다시 언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한 말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불쾌한 말, 실수라고 눙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그걸 비판하는 말이 공공의 영역에서 다 섞여서 증폭됐다. 그 판에선 누구나 말을 보탤 수 있었다. 누구나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의 말은 그 자체로 명확한 표적이니까.
논란 이후, 김구라는 과연 납득할 만한 시간을 보냈다.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의 사과는 또 다른 진흙탕 싸움의 근거가 됐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 같다. 덕분에 온라인 이슈팀이 다시 바빠졌다. 그들은 늘 해왔던 대로 포털 사이트 댓글창을 기꺼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다시 조리돌림이 시작됐다.
농담과 조롱, 멸시의 경계는 사실 미디어 비평의 단골 소재였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비판의 대상은 주로 개그 프로그램이었다. 코미디에선 주로 출신과 외모가 농담의 대상이 됐다. 그 대상이 약자를 향할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뚱뚱한 사람, 못생긴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심지어 장애를 희화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 ‘개그는 개그로만 봐 달라’는 말은 수순 같았다.
비평과 변명이 반복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다. 최소한 그게 불쾌하다는 인식 조차 희미했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농담과 조롱의 경계를 결정하는 건 일단 감수성이다. 그것이 일단 ‘불쾌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시 작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담과 조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개그 소재는 거의 실시간으로 비판 받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조금씩은 예민해진 셈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조롱의 판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나라다. 농담과 조롱과 멸시가 경계도 없이 공공의 영역으로 쏟아져 나왔다. 개그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럴 의지가 있는 모두는 기꺼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성향에 따라 커뮤니티를 이뤘다.
‘일베’라는 이름은 이제 사회학 논문의 주제가 됐다. 커진 판에서, 폭력의 정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형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젠더gender는 영원한 주제다.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가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단은 여성이었다. 그 발언들이 몇 해 전 방송이었다는 말, 그때도 사과했다는 말은 모든 걸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다른 발언까지 찾아냈다. 이번엔 ‘삼풍백화점 생존자 드립’이라는 제목이었다. 역시 참혹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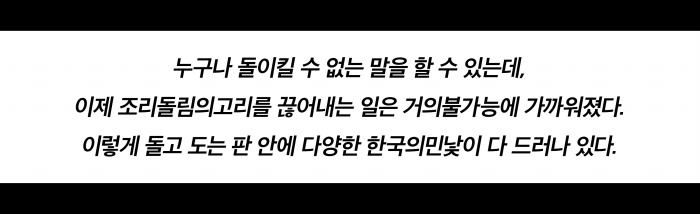
잡담과 잡담이 아닌 것의 기준이 이렇게 흐려졌다. 판은 전에 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뭘 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은 미처 없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가치의 경계도 거의 사라졌다. 누구나, 마음 놓고 뻔뻔해지기에 이렇게 좋은 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옹꾸라’의 발언을 두둔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필 거기 올려서 문제가 됐다”는 말도 들렸다. 장동민과 같이 일했던 한 피디는 페이스북에 “이미지만 천사인 놈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런 인간들보다는 동민이가 천 배 낫다”고 썼다 지웠다. 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썼다 지웠다는 기사가 무수히 남았다. 이제 그 말은 영원히 그 피디의 것이 됐다. 2009년에 ‘남자 키 180센티미터 이하는 루저’라고 말했다가 ‘루저녀’ 딱지가 붙은 그녀가 이후 감당해야 했던 일도 다양한 루트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조리돌림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돌고 도는 판 안에 다양한 한국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다.
농담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웃자고 하는 말이다. 조롱은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말’이다. 조롱이라는 말에는 권력관계가 내포돼 있다는 뜻이다. 우월한 누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같이 웃자는 말이 아니라, 우월한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면서 웃는 말이 조롱이다. 남자 셋이 어떤 여자를 소재 삼아 욕설을 섞어가며 놀릴 때, 그 셋을 제외한 모두는 반박의 기회를 잃는다. 그 안에선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이 된다. 그러니 젠더의 문제를 미뤄두고 판단해도 이미 농담의 범위를 벗어난 말이었다.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기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 형식 안에 이미 권력 구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우월함을 주제로 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상식을 막말로 깬 것부터 잘못이다.
하지만 폭력의 성정은 비겁하니까, 아무 반성도 없이 다수로부터 소수를 향한다. 혹은 약자를 겨냥한다. 그건 전근대 시대의 법칙이었다. 그땐 죽이지 않으면 죽는 사회였다.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차이에 대해, 사회학자 엄기호는 이렇게 말했다. “근대 국가는 생명권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돌보는 형태로 나타난다. 죽이는 것으로 자기 권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다. 푸코가 한 유 명한 얘기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 이게 근대 권력이다. 중세 권력은 죽게 하고 살 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 죽이는 걸 통해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조롱을 통해 권력을 과시하는 나라다.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여성을 공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어른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날씬한 사람은 뚱뚱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지어, 살아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롱은 ‘나는 그들이 아니다’는 안심에서 오는 것이다. 나와 그들을 끊임없이 분리하는 것이다. 전략 컨설팅 회사 ‘아르스 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는 <시사in>에 이렇게 썼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구조는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도 눈앞에서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특히 시스템이 스스로의 작동 원리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길 거부할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숙명처럼 삐걱거리며 살 수밖에 없을 때 구성원끼리의 폭력성은 배가된다.”
어떤 소수가 스스로 소수인 줄 모르고 다른 소수에게 가하는 폭력이 바로 조롱이다. 여기서 ‘소수’라는 말을 ‘약자’로 바꿔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모두가 어떤 점에서는 소수이자 약자라는 뜻이다. 지금 공격의 주체인 사람도 언제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늘 같은 위험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다. 그래도 조롱이 재미있나? 지금, 조롱의 주체와 대상은 다르지 않다.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들끼리 조롱이 권력인 양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서로를 분리해가며 약자가 되길 자처하느니, 스스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사는 길을 도모하는 게 낫다. 도무지 같은 점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적어도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다르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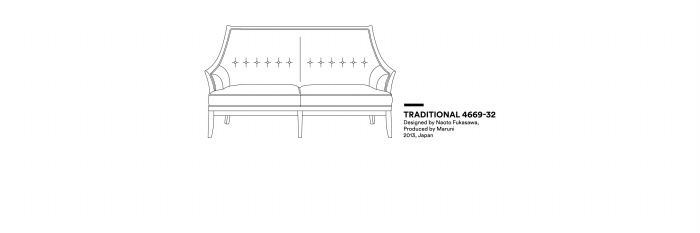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성
- LLUSTRATION
- MUN SU 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