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선물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름. 그들과 제법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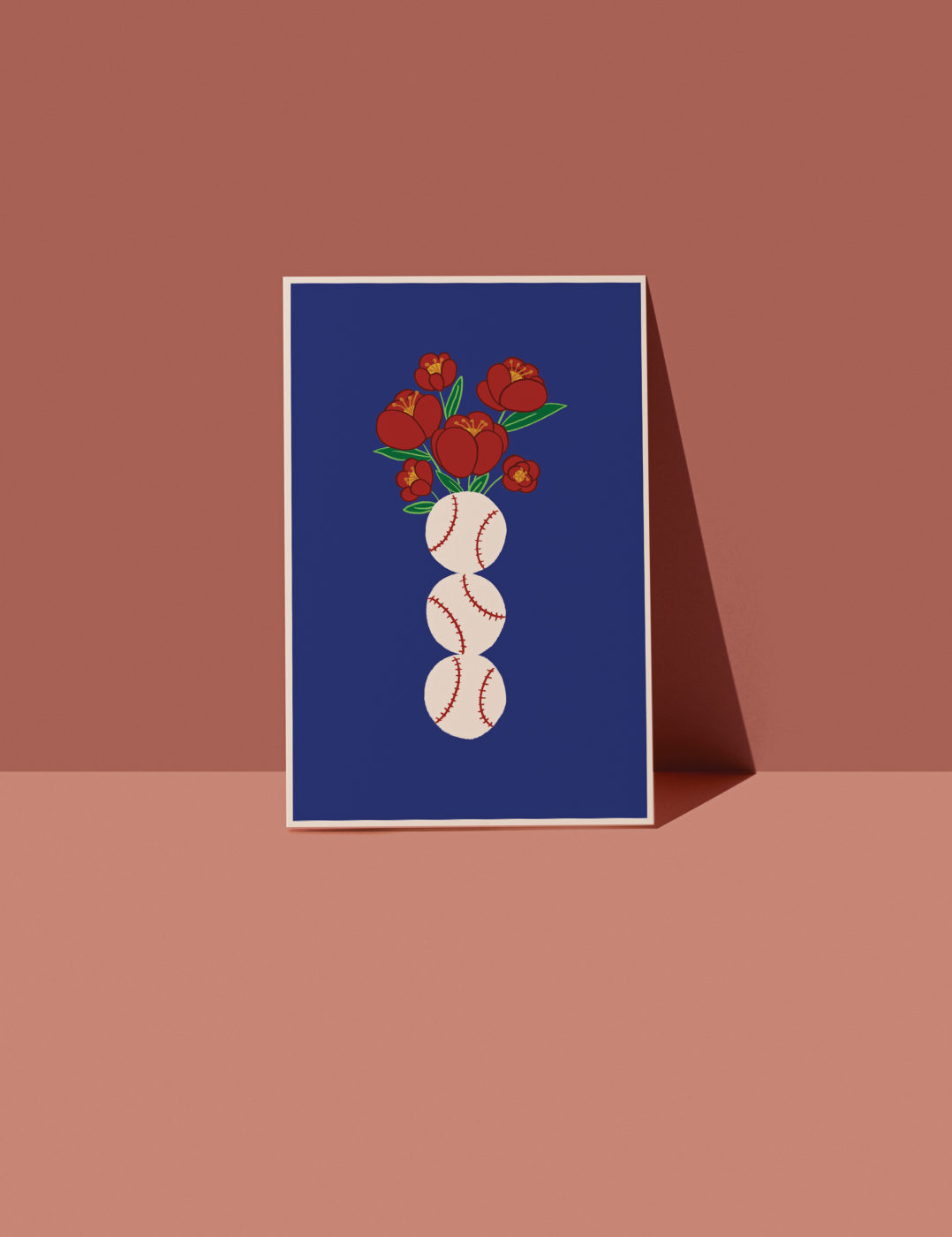
인터뷰 말미, 류현진에게 벼르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직구 중 무엇을 초구로 선택할 건지. 그의 경기 내용처럼 시원시원했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하다. “투수라면 직구를 던져야죠. 첫 타자가 누구든 무조건.” 몇 달 뒤 첫 선발 경기에서 류현진은 자신의 말을 지켰다. 초구는 포심 패스트볼.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아래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의 다짐 한가운데 꽂혔다. 평정심에 일가견 있는 류현진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좋지 않은 일은 훌훌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싹 지우려고 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류현진은 올해 만천하에 보여줬다. 투수 생명을 건 어깨 수술, 잦은 부상, 재활로 범벅된 긴 공백기에서 빠져나온 류현진은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냈다. 바깥으로 휘고, 안쪽으로 휘고, 솟아오르고, 아래로 떨어지는 별의별 구종과 상대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한 완급 조절, 보는 사람을 기립하게 만드는 정교한 제구력으로 야구 괴물들이 뛰는 메이저리그를 지배했다. 방어율 1위, 올스타전 선발 투수, 사이영상 후보. 그보다 더 잘한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나가떨어졌을 혹독한 시기를 이겨내고 전과 같이 무심한 표정으로, 마음먹은 대로 자기 공을 던졌다는 거다. 찝찝한 꿈을 꿨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활약은 그만큼 극적이었다. 류현진을 인터뷰한 날 그의 손에 샴페인을 쥐여주었다. 다시 만난다면 동백꽃 다발을 그의 너른 품에 안겨주고 싶다. 동백꽃은 겨울 칼바람과 자욱한 눈발을 뚫고 산호색 같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다. 바꿔 말하면 올해의 류현진처럼. 때마침 동백꽃이 필 무렵이다. 김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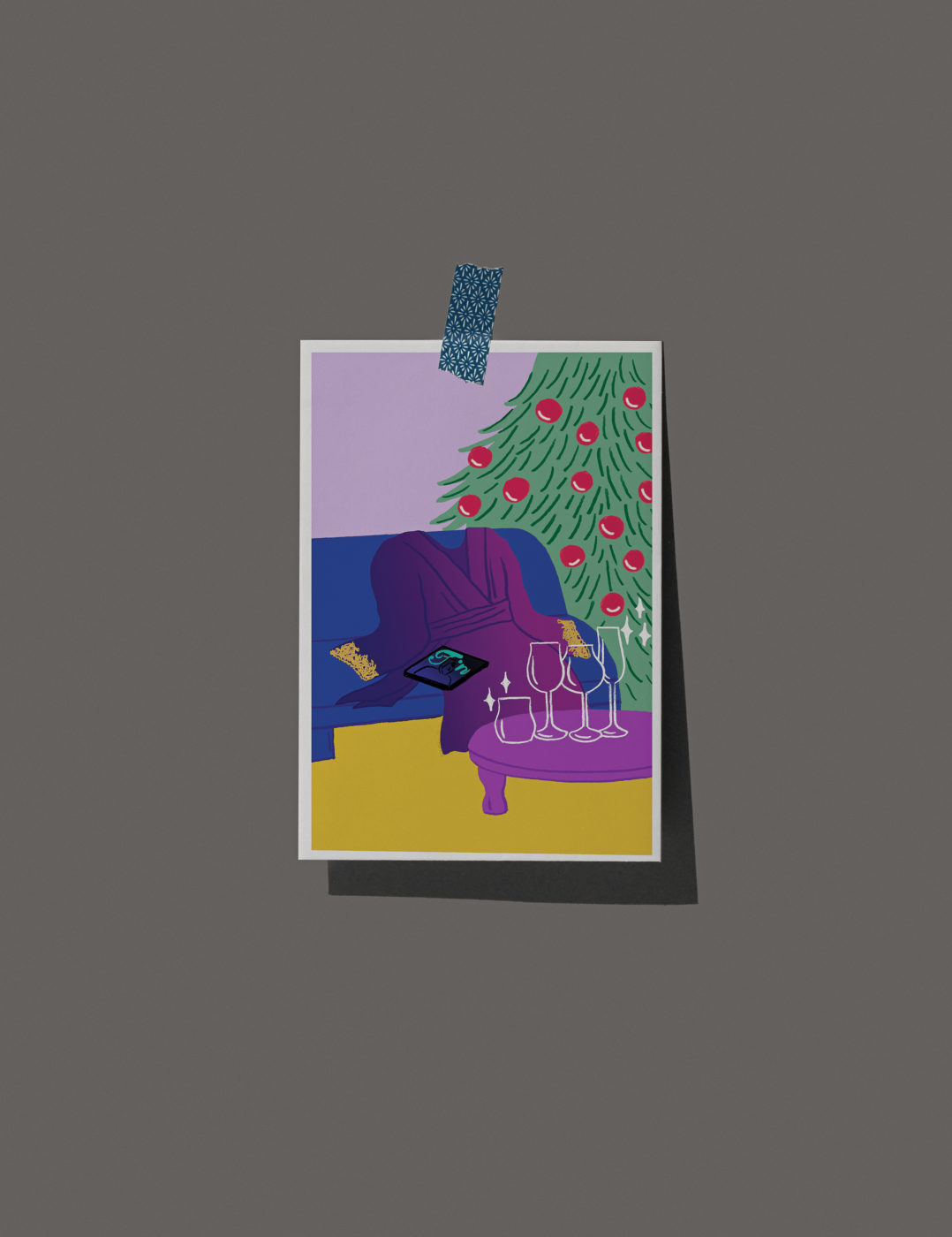
“세상의 남자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랑 잔 남자, 앞으로 잘 남자.” 핑크 새틴 수트를 입은 박나래가 도도한 몸짓으로 기마자세를 취한다. 그는 쉬지 않는 공격수다. 브라운관에서 초면이던 남자들을 한 명 한 명 국민 ‘썸남’의 자리에 앉히더니, 열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메인 MC로 활약함에도 여전히 <코미디 빅리그> 무대에 올라 코미디언으로서 경쟁하고 평가받는다. 왕성한 활동 이면엔 삶을 지근히 쌓아 올린 사람만이 가진 재주가 있다. 남도 음식을 맛깔나게 차려내고, 구제 옷을 대담하게 리폼하는가 하면, 벽지나 전등에서도 오랜 살림꾼의 기지를 드러낸다.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래바’에 모아 친목의 살롱을 만들었고, 덜거덕대는 출연자들 사이를 미끈히 파고들어 균형을 맞춘다. 이건 삶의 왕성한 재능이다.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퍼지게 놀 줄 아는 여자. 두 해 동안 유력한 연예대상 후보였고 올해야말로 적수가 없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 전성기가 3년 이상 지속된 그에게 새삼 반한 건 톱의 자리에 있으면서 ‘잃을 게 있는’ 승부수를 던지는 걸 보고서다. 스탠딩 코미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에서 “놀라셨죠? 어디서 여자 연예인이”라며 수위 높은 개그를 펼치고, “피디님들이 제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체크하러 오셨다”며 천연덕스레 말한다. 개그우먼들의 스탠딩 코미디쇼 ‘스탠드업’이란 거사를 앞둔 그에게, 어떤 와인도 근사하게 마실 수 있는 바카라 와인 잔 세트와 밤에 입는 라펠라의 실크 로브, 디 인터넷 보컬 시드의 노래 ‘Got Her Own’을 선물한다. “그녀는 프로래.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넌 알 필요 없네. 그녀에겐 그녀만의 것이 있대.” 이예지

올해 가장 고마운 목소리를 떠올려본다. 새벽녘, 퇴근길, 버스와 기차 안에서 혹은 하늘 위에서. 기분이 맑거나 어둡거나, 공기가 후덥지근하거나 쌀쌀하거나. 일 년 내내 백예린을 들었다. 올봄 백예린은 <Our love is great>라는 앨범을 들고서 조용히 2년 3개월 만에 기지개를 켰다. ‘야간비행’이라는 몽환의 숲을 지나 ‘지켜줄게’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그의 음악은 샐러드를 먹는 기분이랄까. 천천히 우물우물 씹을수록 건강해질 것만 같은 믿음을 준다. 자작곡으로 채운 일곱 개의 트랙은 백예린이 얼마나 영민하고 반짝이는 음악가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이 앨범을 만들기까지 견뎌온, 축적해온 시간과 감정의 물결은 짐작할 수조차 없다. 음악이라는 미세한 진동이 이토록 깊게 침투해 오래도록 위로를 전해주는 경험이 청자로서 그저 고마울 뿐이다. 1989년 발매한 장필순의 원곡을 2019년 버전으로 재해석한 ‘어느새’, 구원찬과 함께한 ‘너는 어떻게’, 그리고 가장 최신작인 펀치넬로와의 협업 ‘낙서’까지. 백예린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고 부드럽게 비상한다. 그리고 마침내 백예린은 큰 울타리를 넘어 자신만의 소우주를 만들었다. 블루바이닐 Blue Vinyl이라는 독립 레이블을 만들어 유연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간다.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이런 와인 한 병을 슬쩍 보내두고 싶다. 반짝이는 금빛 레이블을 두른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맑고 투명한 잔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거품을 바라보며 한 숨 고르기를 바라며.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을 음미하며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우기를. 고맙다는 말 대신 한잔의 샴페인을 건네고 싶다. 김아름

‘2019 맨 오브 더 할리우드’를 선정한다면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그가 연기한 릭 달튼이다. 블렌더에 데킬라, 레몬 주스, 얼음을 투하해 갈아버리는 박력과 아역 배우 앞에서 시큰하게 흘리는 눈물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아홉 번째 작품을 ‘릭 달튼의 영화’로 만들었다. 감독은 그를 통해 전성기에 대한 상념에 젖어 허우적대는 이들에게 뜨스한 메시지를 전한다. 1960년대 할리우드 스타였던 릭 달튼은 슬프다. 서부 영화의 쇠퇴로 그도 내몰린다. 존재 가치를 증명할 여력은 있지만 야금야금 부정당한다. 하지만 영화의 클라이맥스, 릭 달튼은 다시 일어선다. 의문의 악당에게 화염방사기로 불벼락을 내리는 무자비한 심판자이자 비관에 절어 있던 자존감을 되찾는 집념의 패자부활자가 된다. 잃었던 미소를 되찾게 된 그가 할리우드의 문을 다시 두드리며 영화는 끝난다. 히피 강도들을 향한 릭 달튼(정확히는 타란티노)의 화염이 스크린 가득 치솟는 순간, 현실 세계에서 잔인하게 희생된 여배우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할리우드는 위로를 받는다. 또 반사회적 성향과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 정신이 뒤엉킨 시류 속에서 릭 달튼과 같이 할리우드 신화에 일조한 무명 배우들 역시 진솔한 지지를 받는다. 절망과 위협을 직면하고도 블렌더로 프로즌 마르가리타를 갈아 마시는 여유를 잃지 않는 릭 달튼에게 2019년식 필립스 미니 블렌더를 권하고 싶다. 분노, 자괴, 허풍, 약간의 기회주의로 뒤범벅된 시대를 사는 릭 달튼에겐 앞으로도 쌉쌀하고 달콤한 마르가리타가 필요할 테니까. 이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