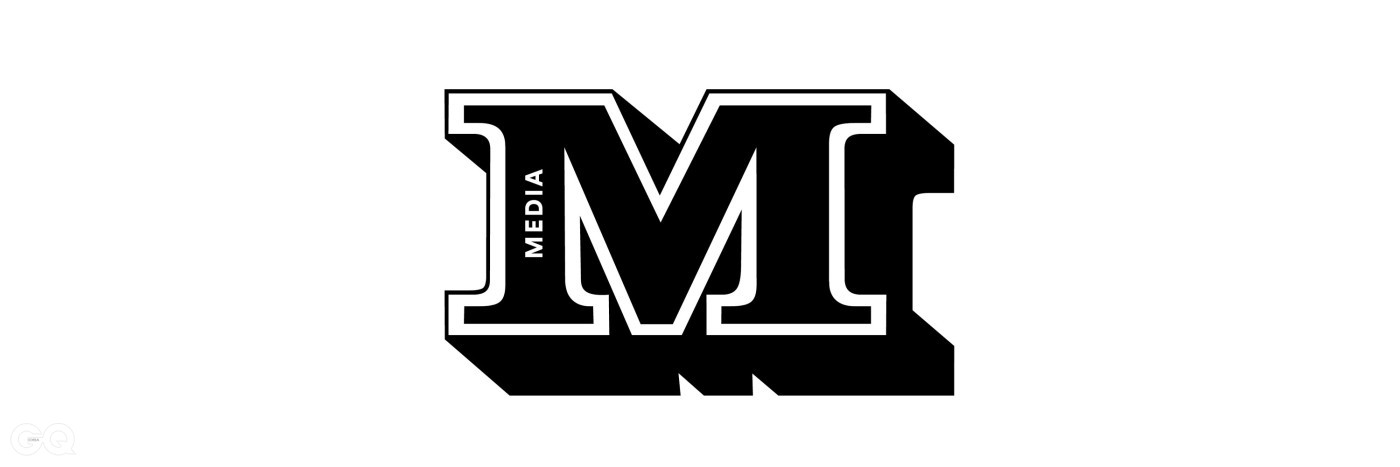한국 사회에는 ‘문화’라는 말이 부과하는 의무감이 있다. 자기계발 서적의 어조로 문화생활을 촉구하는 그 말에 관하여.
영화 잡지들이 있었다. 똑같이 영화를 다루는데 이름은 제각각이었다. <씨네 21>은 영화를 ‘Cine’로, <필름 2.0>은 ‘Film’으로, <무비 위크>는 ‘Movie’로 본다고 뭇 사람들은 말했다. 영화의 예술, 대중문화 혹은 엔터테인먼트 어느 한 면이 도드라졌던 잡지 저마다의 만듦새에서 유추해보건대 그럴 듯했다. 똑같이 영화라고 말한다고 해서 같은 영화가 아니었다.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문화’는 영화를 김밥천국처럼 다루는 태도다. 메뉴에 영화가 있기는 한데, 취향도 신념도 완성도도 없다. 예술 영화에 소홀하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문화의 문제는 예술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일단 다 건드려서 구색을 갖춘다. 하지만 그건 살아남는 전략이지, 제대로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매체로서 한국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닌 포털 사이트의 뉴스 면은 ‘생활/문화’라는 분류를 쓴다. 생활/문화에는 운전 중 DMB 시청을 단속한다는 뉴스와 <정도전을 위한 변명> 같은 논쟁적인 책 소개가 뒤섞여 있다. 이 분류에는 아주 오래된 ‘문화생활’이라는 관념이 들어 있다. “이번 주말에 문화생활 좀 하려고”라고 할 때의 그 문화다. 문화를 향유의 대상이라기보다 여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그 관점에서 라면 교통 정보와 좋아하는 책의 위상이 같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른 두 개 외신의 웹 판은 좀 다른 명명을 한다. 라이프스타일이 주인 <뉴욕 매거진> 웹사이트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분류를 쓴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연예 섹션과는 다른 범주로, 생활/문화 섹션에 준한다. 아트, 북, 클래식, 댄스, 영화, 연극, 음악, TV를 하위분류로 두기 때문이다. 정치/사회 가 중심인 <뉴욕 타임스> 웹사이트는 ‘아트’가 이에 해당한다. <뉴욕 매거진>과 거의 같은 하위 분류를 가졌다.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매거진>의 흥미 위주의 접근을 보여준다면, 아트는 <뉴욕 타임스>의 권위적인 얼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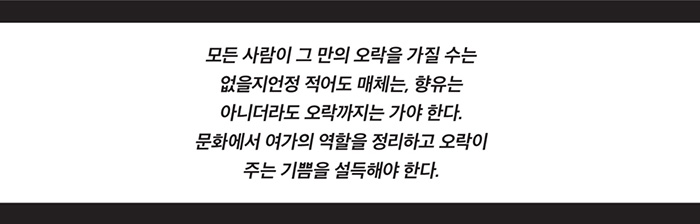
문화는 명쾌하지 않은 범주다. 막연하고 큰 데다 개인의 창작물을, 작품 바깥의 말들로 더 시끄러운, 공적인 영역으로 밀어넣는다. 아트는 존중해야 할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다면, 문화는 내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작품이 수용자와 만나 기름과 물이 되던, 물과 물이 되던 할 것이 시민 사회의 준거에 시달리는 공공의 재산이 된다. 현대의 문화는 “계몽주의 시대와는 달리 방향성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전에 계획된 방향성은 아닌 변화(<유행의 시대> 지그문트 바우만)”로 이루어진다. 문화는 온갖 사적인 취향의 충돌이 만드는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화 대통령’이 있다지만, 그조차도 개인의 취향을 보편적인 음악적 표현으로 전달한 것 뿐이다.
다만 <뉴요커> 웹사이트에도 ‘컬처’라는 섹션은 있다. ‘아트와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노트’라는 주석이 달렸다.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인지 쓰고 지킨다는 점에서 다르며, 문학적 저널리즘의 대명사답게 북 섹션은 따로 갖춘 점이 돋보인다.
<가디언>의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다. 두 매체의 컬처 섹션은 생활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뉴욕 매거진>, <뉴욕 타임스>의 웹사이트의 경우 역시, 생활과 밀접한 항목은 아트, 엔터테인먼트와 별개로 패션, 스타일, 레스토랑, 바 등의 섹션을 만들었다. 생활/문화와 근접한 전시, 여행 등은 하위분류에 있기는 하나, 별도로 ‘이벤트’라는 항목으로 소화한다. 미술이 아니라 ‘전시’를 앞에 놓고 말하고, 음악이 아니라 ‘공연 소식’이 우선하는 뉴스와의 차이다. 이런 것들이 매체가 문화에 대해 갖는 태도다.
더 충실한 사회생활을 위해 가지는 재충전의 시간이 여가라면, 사회생활에 아무 도움은 안 되지만 일터 이외의 시간을 즐기는 개인적인 거리를 오락으로 분리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향유는 소유욕과 밀접한 애호가적 취미로 떼어놓는 게 자연스럽다.) 나열한 외신들이 보여주는 게 오락이라면, 한국의 생활/문화라는 분류가 드러내는 건 여가다. 여가는 ‘문화생활’의 발로이며, “문화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흔히 ‘오락’이라 불리는)게임이 한국에서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공공적이지 않은, 사회생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걸로 보이는) 오락이 죄와 다름없는 형국은 당연하다. 한국에서 문화는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대상과의 사이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하나의 현상으로 대두된 바이닐 레코드를 <다큐멘터리 3일>에서 다룬 적이 있다. “사람들이 떠나 있었던 것이지, 레코드는 늘 여기 있었다”는 레코드숍 사장의 말은 스쳐 지나가고 옛날 음악을 듣다가 추억에 잠겨 눈물을 쏟는 손님, 낭만적인 음악가였던 레코드숍 주인, 머라이어 캐리 음반을 찾는 손님이 말하는 추억과 향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송이었다. 회현지하상가가 바이닐 레코드의 부흥과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전의 은 함량을 소리로 알아맞히는 소년은 별 세계의 인물처럼 지나갔다. 그 소년이야말로 회현지하상가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다. 새삼스럽지만 잊는 것. 매체의 태도는 핵심을 완전히 바꿔서 전달할 수도 있다.
정작 바이닐 레코드 업자들은 입을 모아 레코드가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공중파에서는 ‘추억의 LP’가 돌아왔다는데. 한국에서 여가는 마땅한 오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무로 부과된다. 나와 내가 관심을 쏟는 대상 바깥에서 유행이 휘몰아치면, 다른 사람들의 향유나 오락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도 당연히 알아야 할 문화로 받아들인다. 문화 면에서 나열하는 맛집을 가본 적이 없거나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얇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이곳을 요동시킬 현상이 만들어질 리 없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보다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고, 그래서 각각의 영화 잡지가 가졌던 것처럼, 고유한 이름의 신을 만들 수 있는 건 오락이나 향유를 통해서이지 여가를 통해서가 아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생산하고 씨 뿌리고 싹 틔움으로써 유혹하고 매혹하느라 바쁘다.(<유행의 시대> 지그문트 바우만)” 한 사람이 이런저런 분야를 얕게 안다는 건 지적 호기심이지 향유도 오락도 아니다.
“내가 못난 탓에 형편없이 살게 되었다는 생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이 유별나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어느 한 사람의 변덕스런 자기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조직하는 원리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동진)” 한국인의 자기계발의 의지는 사회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모든 사람이 그 만의 오락을 가질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매체는, 향유는 아니더라도 오락까지는 가야 한다. 문화에서 여가의 역할을 정리하고 오락이 주는 기쁨을 설득해야 한다. 문화를, 매체가 아닌 개인이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시즌마다 열리는 런웨이를 담은 기사 제목에 여전히 “아슬아슬 보일 듯 말 듯”이 가장 많은 나라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신기사
- 에디터
-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