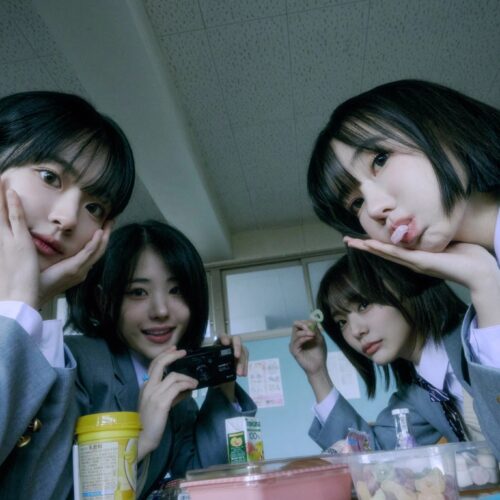한국은 유니폼의 나라다. 누구든 학생, 어른, 부모, 시민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상황과 마주 한다. 그중 독보적인 게 바로 남자다움의 유니폼이다. 이 유니폼이 강요하는 것은 강함이다. 남자는 늘 대범해야 한다. 사소한 것에 반응해서도 안 된다. 그건 ‘진짜 사나이’가 아니다. 이런 남성성이 하나의 도덕성을 확보하다 보니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며 해병대 체험 캠프를 가는 촌극이 벌어진다. 창의와 병영 의 간격을 억지로 메우는 이 캠프는 그 규모가 연간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면서 결국 참사가 일어났다. 2013년 여름 다섯 명의 고등학생이 사망한 해병대캠프 사고는 한국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은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갈망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바다 안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던 중 학생들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렸다. 실종된 다섯 명은 다음 날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아직도 매년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이런 체험을 한다. 학생들이 통나무를 들고 고함을 지르거나 화생방 훈련을 하면 서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범벅된 모습이 현실이 된다. 이 모습이 찍힌 사진들은 외국 언론에서 ‘올해의 웃긴 사진’으로 소개되거나 ‘조작일까요? 사실일까요?’라는 웃지 못할 퀴즈 문제로 등장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군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난리다. 왕따를 당한 병사가 총을 난사하고, 동작이 좀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단 구타 끝에 사람이 죽는 비극이 등장해도 이 사회는 일상의 병영화를 만들고자 발악한다. 신입사원 연수에서 기마자세 버티기, 철야 행군 같은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 일밤-진짜사나이 > 여군 특집은 “남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는 닭살 돋는 멘트를 기어이 끄집어냈다. <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는 네 살짜리 아이에게 병영 체험을 시키는 기괴한 일도 발생했다. 아이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입소식을 했다. 경례도 했다. 눈물을 보인다고 교관에게 혼나기도 했다. 그 모습에 송일국은 응석받이로 자란 아이들에게 규칙과 틀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어른스러움을 보였다며 (불과 네 살짜리에게!) 흐뭇해했다. 언론은 방송의 캡처 화면을 모아 뉴스라며 클릭을 유도했다.
문화라는 울타리가 사회의 비정상을 보호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예능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군대 콘텐츠는 군대를 한 번쯤 기꺼이 경험해볼 만한 가치로 만든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사회에 만연해진 군인 정신의 필요성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빈번해진 시대를 맞아 전략적 글쓰기의 소재로 정당화되기 까지 한다. ‘나중에 스펙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는 것이 병영 캠프를 가는 이유이니 얼마나 황당한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오랫동안 군소리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의 인재상이 되면서 과거의 군사 문화는 죽지 않고 확대 재생산된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군대 아닌 곳에 군인정신이 들어오니 한국에서는 “여기가 군대야?”라고 물을 만한 무수한 상황이 존재하게 됐다. 한국은 가정, 학교, 일터에 군대에서나 통할 법한 서열관계가 명료하게 형성됐고, 윗사람(부모, 교사, 상사)에게는 권위주의를, 아랫사람(자녀, 학생, 부하)에게는 복종과 체념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런 바탕에서 온갖 비상식이 발생하지만, 일상이 군대인 세상에선 이런 것이 문제일 리 없다. 모름 지기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일을 모름지기 사람은 그런 거라며 합리화한다. 끔찍하다.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 저자)
- 출처
- Gettyimages / 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