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가장 많은 촛불. 붐비는 호의와 너그러움. 가지 위에서 반짝이는 서리. 흰 눈에 맞서는 검은 코트. 열띤 볼. 이른 황혼의 입김. 바람에 저항하는 실내의 귤색 불빛. 회한을 남기지 않는 구매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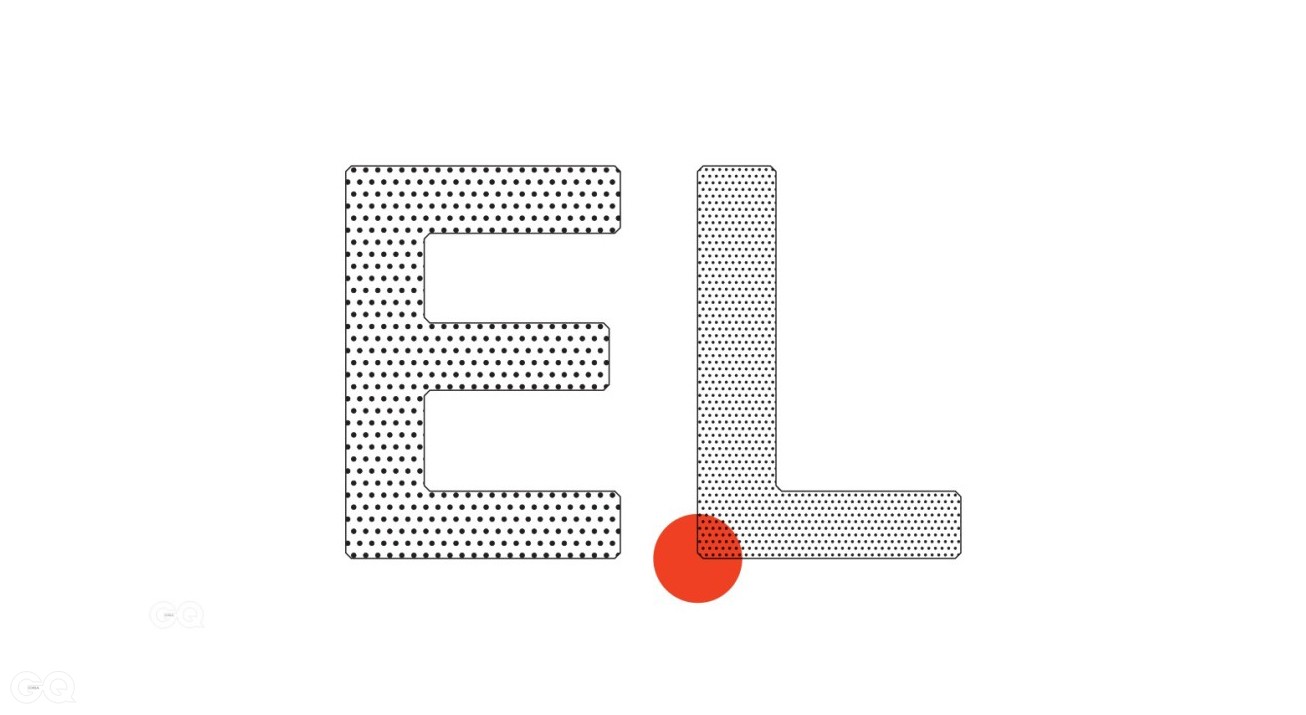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발명품은 시간 같지만, 실은 달력이다. 더더구나 시간은 임의로 흐르지만 달력은 불변이다. 1년을 12달, 52주, 365일로 나눌 생각은 누가 한 걸까? 그걸 다시 8,760시간, 525,600 분, 31,536,000초로 쪼갠 건? 결국 사람의 일생은 살아 있는 날의 계수함에 따라 정해진다.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골라 공식화하는 이들의 능력도 놀랍다. 매년 그날은 개개인의 휴일이 되니까. (‘우리 만난 지 천 일’ 같은 건 좀 별로다. 제대로 세자면 내년까지 걸릴 것도 같고, 또….) 사람들은 일기를 발명했다. 이어 시계를 만들었다.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 초능력으로도 하루의 길이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순 없다. 시간을 거슬러 반복할 수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발명품은 시간 같지만, 실은 달력이다. 더더구나 시간은 임의로 흐르지만 달력은 불변이다. 1년을 12달, 52주, 365일로 나눌 생각은 누가 한 걸까? 그걸 다시 8,760시간, 525,600 분, 31,536,000초로 쪼갠 건? 결국 사람의 일생은 살아 있는 날의 계수함에 따라 정해진다.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골라 공식화하는 이들의 능력도 놀랍다. 매년 그날은 개개인의 휴일이 되니까. (‘우리 만난 지 천 일’ 같은 건 좀 별로다. 제대로 세자면 내년까지 걸릴 것도 같고, 또….) 사람들은 일기를 발명했다. 이어 시계를 만들었다.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 초능력으로도 하루의 길이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순 없다. 시간을 거슬러 반복할 수도 없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내내 고수했던 것들이 변할 때도 11월이 좋았다. 추위엔 청결한 도취가 있었다. 한 해의 끝에서 지난 1년을 추궁할 때 12월은 뭔가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으나, 11월엔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한 달이 남았어,라고 스스로 유예시켰기 때문에. 11월이야. 아직도 31일, 744시간이 남았어…. 6개월 내내 눈, 얼음, 진눈깨비, 차디찬 비를 뿌리는 겨울은 아니지만… 11월은 오린 듯 외롭다. 그리고 별이 총총한 밤이 지나 다음 날 바삭한 아침의 정적. 파아란 불꽃이 타오르는 담배. 신문지에 놓인 사과의 어떤 우수. 번성하던 것들의 이지러짐. 오후의 창백한 분홍 태양. 어둑한 산의 주황색 팔레트. 땅에 고인 물에 비치는 나무의 암갈색 밑동.
어떤 11월엔 나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예전보다 열과 추위에 더 원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4월의 따스한 공기가 다시 좋아졌다. 질질 끌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고요한 바람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 기적과 같은 맛이 섞여 있었다. 매일 저녁, 달빛 아래 어리둥절한 즐거움 속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하루하루가 병적으로 빨리 지나갔다. 이런 막간이 금방 사라질까, 초조는 즐거움을 손상시킬 정도였다.
3월의 음울한 대기는 어그러진 약속 같았다. 남은 눈은 다 녹고, 산중턱에서 싹처럼 돋는 안개는 겨울이 다 지나갔음을 알렸다. 해의 아치 위에 드리운 구름, 봄비의 습기 속에서 1월의 바스라진 회색빛을 그리워할 때면 순진한 세상이 어서 다가올 거라는 여린 몽상이 몽글거렸다.
3월에서 두 달이나 벗어난 5월 아침엔 셔츠에 땀을 흘려도 상관이 없다. 순을 틔운 나무와 열린 꽃봉오리. 옷가게 밖으로 울리 는 음악. 빵집 앞에 늘어선 쾌활한 줄을 보면 나쁜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듯 마취된다. 욕망의 무정부 상태랄까. 초여름 옷을 입은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은 기혼자 처지를 후회한다. 온기가 남은 밤엔, 올해는 작년보다 나으리란 믿음,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 과장된 믿음이 웅성거린다.
1월은 싫었다. 첫날의 새 결의가 순식간에 헌것이 되니까. 31일 도 실수 같았다. 31은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없다. 반쪽 달月, 반쪽짜리 주週도 만들 수 없다. 무엇일까, 이런 모호한 실망은?
2월은 오기도 전에 싫증 났다. 다른 달보다 인색한 달이라서.
8월의 휴가도 늘 실망스럽다. 기대가 그렇게 컸으니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 햇빛이 해바라기 샤워기의 물줄기처럼 쏟아져도, 아무리 열매가 열려도, 8월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8월의 메아리가 조금 더 멀리서 들릴 때 9월은 노래한다. 가로 수의 나뭇잎은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이 지네.
시작도 끝도 없는 달. 7월에 일어난 일은 영원한 여름이라는 천에 스며든다. 과수원의 비현실적인 그림자. 댓돌 위의 요란한 비. 밀집된 빛이 희미해지는 어떤 단계. 망토처럼 퍼지는 수증기. 멀리 서 웃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와 숨바꼭질한다. 우린 다 한때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었다. 은밀한 연인은 숲에서 만난다. 단단한 살의 무중력. 축축한 주택가 계단. 그 아래서 일렁이는 몸. 남자의 야릇한 산책길. 프린트 원피스를 입은 바닷가의 여자. 소문과 가면극.
10월은 과거와 현재, 두 방향에서 온다. 축축한 밝음. 진고동색 의 환각. 어둠은 계절의 면적을 다 덮는다. 불만족스러운 서쪽 달. 신들의 따분한 행진. 나무 타는 맛이 나는 공기의 응답. 빙점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북극의 난민처럼 하늘 아래 서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낯선지 비로소 알게 된다. 10월은 어쩌면 한 해의 진짜 마지막 달 같다. 종말이 아닌 하나의 미스터리로서.
12월은 더 외롭다. 12월엔 살이 쪄서. 슬픈 집중. 노출된 우울. 어두운 인내심. 가장 많은 촛불. 붐비는 호의와 너그러움. 빛나는 동반의 뜻. 잠자는 애들은 마술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모들은 소파에 앉아 졸며 점심을 기다리는 상냥한 시간. 다른 세계로 스며들 것 같은 이상한 투과성. 가지 위에서 반짝이는 서리. 흰 눈에 맞서는 검은 코트. 열띤 볼. 이른 황혼의 입김. 용납할 수 있는 비의 냉랭함. 바람에 저항하는 실내의 귤색 불빛. 가장 차가운 샴페인 한 잔. 회한을 남기지 않는 구매 행위….
12월 마지막 밤.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무엇이 그렇게 애절했는지는 다 잊었다. 숫자를 붙이고 싶은 새벽이 찾아오면 다시 깨닫는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름답다고.
최신기사
- 에디터
- 이충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