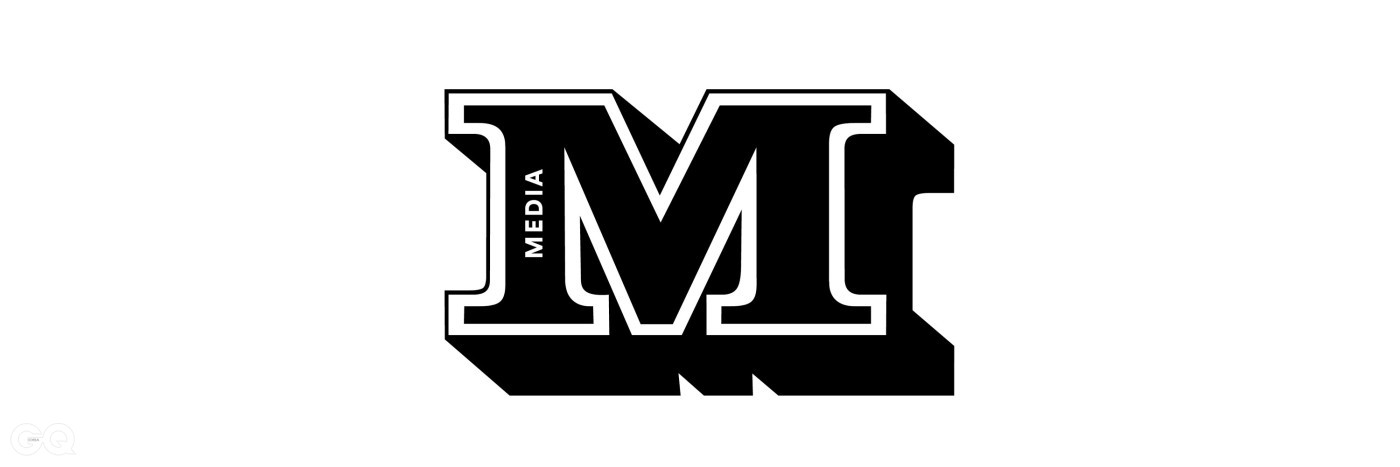시간과 사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굳이 검색하고 해석해본다. 그래야만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다.
조디 캔터 <뉴욕 타임스>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대중 목욕탕에서 본 한국문화A Look at Korea’s Culture From the Bathhouse’였다. 2014년 2월 9일, <뉴욕 타임스> 주말판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은 ‘가면을 벗은 한국Korea Unmasked’이었다. 사진에는 한 커플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여자친구 무릎을 베고 누워, 둘은 얼굴에 팩을 하고 있었다. 조디 캔터는 그녀의 한국인 친구와 서울, 대전, 부산의 찜질방을 돌면서 보고 느낀 것을 썼다. 때를 밀었던 일, 화장품 쇼핑, 미용실에서 속눈썹을 붙였던 일과 너무 많은 성형외과, ‘제2의 도약’ 같은 성형외과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기사에 동의하거나 오해라고 여겼다. 똑같은 가운을 입는 것을 두고 유교를 언급하거나 찜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사람을 두고 ‘과도하게 일하는 이 나라의 상징’이라 쓴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수 있다.
더 재밌는 건 이 기사를 받아서 소개한 한국 언론이었다.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은 “NYT 특파원, ‘한국 찜질방? 질 낮고 우중충’”이었다. 기자는 이렇게 썼다. “문제는 이곳 장소들을 좋지 않게 묘사한 데 있다. 가령 그는 자신이 갔던 찜질방을 거론하며 ‘질 낮고 좀 우중충하지만 저녁에 과음하고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유명하다’며 ‘한국에서 찜질방에 가는 것은 쇼핑몰에서 목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의 제목은 “NYT 특파원 ‘한국 찜질방 옷 여자 교도소 연상케 해’”였다. 내용은 비슷했지만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었다. 대신 ‘디지털 뉴스팀’이라고 썼다.
한국 언론은 조디 캔터의 기사가 불쾌했던 거다. 그 불쾌함을 조장하고 있었다. 기사는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그곳 장소들을 좋지 않게 묘사한’ 것이 그녀 혹은 <뉴욕 타임스>의 ‘문제’인가?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었다면 기사의 내용이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 독자가 읽었을 때 비교적 불쾌할 수 있는 문장만을 골라 옮긴 기사였다. <뉴욕 타임즈> 기사의 원문이나 누군가의 번역본을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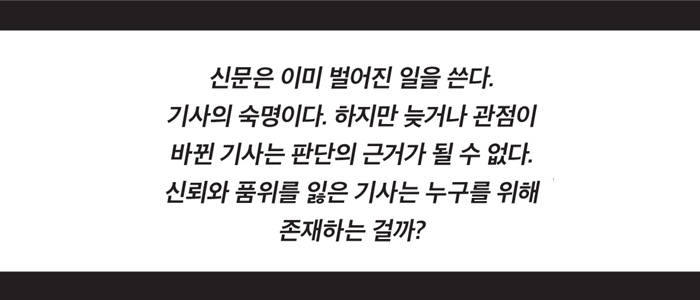
한때 ‘언론 생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외신 번역 프로젝트가 화제가 됐다. 누군가 “하루에 한 기사씩 외신을 번역해 드리면 관심을 두고 보실 분이 계신가요?”라고 올린 트위터 맨션에 1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시작됐다. 여럿이 번역과 감수를 거쳐 가치 있는 외신을 번역해 블로그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은상 (가명)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신문은 거의 정치 이슈가 1면 톱이죠. 국제 면은 부족해요. 좋은 국제기사, 정확하고 깊은 분석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반응은 예상 못했죠. 사람들은 뭔가에 목말라 있었어요.” 갈증과 답답함의 근거는 간단하다. 한국에서 쓰지 않는 혹은 쓸 수 없는 기사를 눈치 보지않고 쓰는 다른 나라 기자의 시각과 그가 취재한 사실이 궁금했던 것이다. 국제 면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소치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에게 현지 기자회견에서 결혼설이나 ‘꿀벅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언론 대신, 비슷한 시기 <뉴욕 타임스>가 만들어 올린 쇼트트랙의 과학에 대한 멀티미디어 기사를 원한다는 것이다. 검색창에 안현수를 검색했을 때 마구잡이로 걸리는 수백 개의 기사가 동어반복에 불과할 때, 그 공해에 질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한국 언론 천박하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론지와 상업지 사이의 균형, 체면을 지키려는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죠.” 박은상이 말했다. 문화, 스포츠 분야의 뉴스는 그나마 덜한 편이다. 정치, 경제 쪽은 그 갈증의 격차가 더 크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조가 다른 건 언론사라면 당연하다. 그래야 옳다. 하지만 지금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다. 경제 면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한발 늦는다.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트레이더, 칼럼니스트인 김동조는 이렇게 말했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외신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현지 입장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하는 기자가 필요하니까요. 미국은 전문가가 칼럼이나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기자 자신이 전문가 급인 경우도 많아요. 국내 매체는 일단 기사가 적확한 시점에 나오지 않죠. 하루 이틀이라도 늦어요. 해석을 잘못한다거나 자기 입장에 맞는 관점으로 바꿔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신문은 이미 벌어진 일을 쓴다. 일은 이미 터졌거나, 상당 수준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이건 기사의 숙명이다. 하지만 국내 매체는 그마저도 늦는다. 돈은 한국에서만 도는 게 아니다. 늦으면 잃는다. 그 와중에 관점까지 바뀐 기사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뢰와 품위를 잃은 기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그렇다고 모든 외신이 객관적일 거라는 기대는 곤란하다. 언론사에는 언론사의 입장이 있다. 입장이 논조를 만든다. 기사는 논조를 따른다. 외신도 다르지 않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혹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같은 말에 절대적인 권위와 지위가 따르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사의 분석적 깊이와 전문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좀 다른 맥락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사가 기자를 고용하는 방법, 한 명의 기자가 소화해야하는 기사의 분량, 포털 사이트의 지긋지긋한 클릭수 경쟁…
하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논의조차 미뤄둬야 하는 것 같다. 적어도 외신이 한국을 다룰 땐 한국 독자를(그게 누구라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역설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그들의 독자를 위한 기사를 쓴다. 한국 언론사가 보는 눈치를 그들이 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는 기자인 친구에게 재판장에 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복잡다단하고, 때론 어딘가에 감춰진 것 같은 한국의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한국의 80년대 얘기였다.
얼마 전,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4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57위였다. 2013년에는 50위, 2009년에는 69위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0위권 안으로 진입한 적이 없고, 3년째 하락 중이다. 기자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어딘가에 깊이 잠겨 있다. 대통령을 포옹하면서 “너무 안고 싶었어요” 말하거나, 오전엔 방송국 문화부장이었다가 저녁엔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하는 또 다른 기자가 눈에 띌 뿐이다. 한국 언론사와 기자가 자유 대신 선택한 건 뭘까? 선택의 여지라는 게 있긴 했을까? 알면서 묻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런저런 외신을 알아서 전해주는 도구로 쓴다. 관심 있는 분야의 외신 기자 몇몇을 목록에 걸어놓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가면 큰일 나는 곳의 풍경을 태연히 찍어 올리는 사진가도 있다. 내가 못 가는 곳에 가는 다른 나라 기자, 내가 쓸 수 없는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또 다른 나라 기자…. 한국에서 읽을 수 없는 기사를 쓰는 언론은 전 세계에 있다. 이 정도면 녹색 창 대신 외신 사이트에서 ‘South Korea’를 검색하는 충분하고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알고 싶고, 알아야 한다면 말이다.
- 에디터
-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