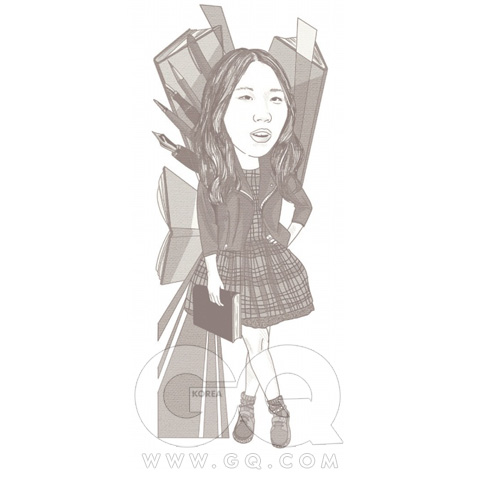
김사과의 신작 장편소설 <천국에서>를 읽고, 뭔가를 말하기에 앞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의 소설들이 어떤 의미에서 망설亡說 계열임을 떠올리면, 망설임이 어울 리기는 한다. 아니, 이런 말장난이라면 어딘가 부적절하다. 한 인터뷰에서 ‘말장난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김사과조차도 이 말장난은 별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쩌나. 김사과의 소설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어긋남, 공백, 비약, 결함을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김사과가 만들어내는 ‘서사’의 힘이 약하다는 지적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그의 소설을 이야기 그 자체로서만 본다면, 별로 새롭지 않을뿐더러 따분할 때가 많다. 그런 약점을, 김사과는 여러 가지 다른 재능으로 가려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재능들이 돋보였기에 독자들은 서사의 약점을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
다른 재능이라면 무엇보다 그의 ‘공부’를 들 수 있다. 흔히 ‘젊은 작가’라는 이상한 범주로 묶이는 동료들과 비교할 때 그의 공부는 더욱 도드라진다. 인문사회과학을 두루 공부하고 스스럼없이 그 성과를 소설에 드러내는 태도는 어쩌면 독보적이라고 해도 좋다. 소설에 버무려진 그의 사회과학적 시각은 충분한 통찰력을 드러내서, 그에 공명하는 독자로서는 서사의 약함에는 한결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관념의 리얼리즘에 가까운 그의 소설에는 다른 장치로 가리기 힘든 공백과 비약이 자주 출몰한다. 독자의 일부는 그런 지점에 걸릴 때마다 소설의 결함을 확인하고, 독자의 일부는 오히려 그런 점에 개의치 않고 마구 질러가는 김사과의 재능을 찬양한다.
김사과 자신은 어떨까. 소설에 기대고 있지만 소설보다 커지기를 바라는 ‘글쓰기’를 실험하는 그로서는, 정작 소설적 재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서사의 힘’이 부족하다는 곤란함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작인 <테러의 시>에는 이런 의문과 한계에 대한 김사과의 전략이 숨어 있다.
서툴고 거친 면모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김사과 스스로 자신의 소설이 ‘작품’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소설의 실패를 ‘실패하는 소설’의 계보로 옮겨 놓고, 짐짓 그것이 전략마저도 아닌 것처럼 의뭉스레 밀고 나가기. 때론 더 나쁜 쪽으로까지. 단순히 소설의 실패를 위장하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니다. 그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위대한 소설가들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전략이라고 바라봐야 공정하다.
또 하나는 자신의 소설을 ‘시화’하는 것이다. <테러의 시>는 제목부터 정확하게 이런 전략의 산물이다. 서사로서 따지면 이상한 요소들을 시로 바라보면서 건너 뛸 수 있게 만들기. 서사적 개연성이나 인과성이 아닌 시적 개연성이나 인과성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한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자신의 결함과 부족에 대한 자연스런 내적 논리의 귀결이기도 하다. 평론가 김영찬의 말처럼 김사과가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소설”을 써왔다는 평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설이 “한국사회의 현실에 절망적인 분노로서 반응하고 분열증으로서 싸우는 소설”이란 평가에는 반쯤만 동의한다. 오히려 김사과 소설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서평가 로쟈의 적실한 지적처럼 그런 분노를 폭발시키는 ‘얇은 인간’의 발명이다. ‘얇은 존재성’을 지닌, 김사과가 그려내는 이 인물들이 또한 지금 당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푸는 그물’ 같은 자아, 축적을 불신하려다 성숙의 기회마저 놓치고 마는, 그 헛헛한 자아. 그 헛헛한 자아가 자기의 과잉된 기분이 세계의 실재가 되어야 한다는 냉소를 ‘진정성’ 있게 욕망할 때의 비극.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껏 독자들은 김사과가 발표한 소설에서 엿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봐온 김사과는 보기 드문 냉소의 전문가 였다. 현실 세계를 냉소하면서 그 현실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냉소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냉소하는 인간의 ‘휴머니즘’ 자체도 냉소한다. “휴머니즘의 맛” 자체를 혐오하는, 반휴머니즘이 어디까지 이를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김사과는 <테러의 시>에 등장하는 제니가 집 안 전체의 휴머니즘을 세제로 말끔히 제거하고 거품 목욕을 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살짝 벌어진 입을 보면 그녀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 뉴욕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끝나는 이번 장편소설 <천국에서>는 “모든 게 망가졌는데 왜 아무것도 무너져 내리지 않지?”라는 질문이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한 가지 색에 사로 잡힌 채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 장편소설 <테러의 시>는 황사에 묻힌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해서 “문득 제니는 자신이 여전히 서울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로 끝난다.
이런 연속과 단절을 고려할 때, “어떤 기대도 절망도 없이” 자신이 여전히 서울에 있다는 걸 깨닫는 <테러의 시>와 비교해서, “그녀는 봄이 왔음을 느꼈다. 여름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로 끝맺는 <천국에서>에서는 김사과의 냉소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일까.
대체로 아직까진 이전 소설들에 비해서 분노도 냉소도 한결 가라앉았다는 평이 많다. 김사과 스스로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토리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게 썼”지만 “이전의 내 소설들을 읽은 독자들은 기존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진지하게 무심히 들으면 되는 말이다.
한편, 이번 소설에서 김사과 소설이 다루는 현실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반갑다. 그간 김사과 소설의 공간은, 관념이 아닌 실제 현실의 범위를 고려하면, 이번 <천국에서>라는 제목을 보고서도 그가 이전 소설에서 언급했던 ‘김밥천국에서’인가,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천박한 한국, 천진한 미국. 앞의 형용사도 뒤의 나라도 그 밖의 다른 것이어도 좋은, 그런 ‘천국에서’ 김사과의 소설 공간의 확장을 확인해볼 기회가 생긴 셈이다.
김사과의 소설과 공부와 에세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에세이다. 하지만 에세이는, 그리고 그의 공부는 소설이라는 듬직하고 거대한 커튼 뒤로 숨을 수 없고, 또 소설의 결함을 ‘시화’시키는 것과 같은 전략을 사용 하기엔 어려운 장르다. 그래서 종종보다는 자주 그의 에세이는 비약을 하고 그만큼의 결함을 노출하곤 한다.
그러니 당분간은 전략적으로라도 김사과가 자신의 야망을 소설에 기대기 바란다. 물론, 이젠 ‘김사과적인’ 소설의 존재만으로 가치를 부여하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고민 끝에, 김사과의 <천국에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지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다. 지지한다는 판단에 반드시 소설의 뛰어남이 전제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일 만큼은 유보적으로. 이유는 예전에 그의 소설집을 짧게 비평할 때 회의적으로 썼던 구절로 대신한다. “희소성이 그대로 가치인 시대가 있다. 드문 것은 분명 주목하게 만드니까.” 이 땅의 현실에, 특히 최근의 (젊은) 소설에, “어떤 기대도 절망도 없”지만 회의를 지지로 뒤집는 상황의 되풀이는 유감이다.
최신기사
- 에디터
- 글/ 박준석(문학평론가)ILLUSTRATION/ KIM JONG HO





















